

김정석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인구학회장
긴 연휴를 하루 앞둔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언론은 장수 어르신의 웃음과 경로 행사 소식으로 기념일을 밝혔다. 동시에 고령화의 속도와 돌봄·빈곤·치매 문제도 함께 짚었다. 사회의 시선이 또 한번 노인에게 쏠리는 시기다. 그러나 정작 노년의 길목에 서 있는 중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중년은 누구인가. 대체로 40대에서 60대 초반을 가리킨다고는 하지만, 꼭 나이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하루쯤은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중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첫째, 중년은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음새다. 허리 구실을 하는 이음새가 사라지면 전체가 무너지지만, 정작 그 자체는 눈길을 끌지 못한다. 중요한 일을 맡고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중년이 위치한다. 둘째, 중년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덧씌워져 있다. 돌봄과 생계 모두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세대이고, 사회도 그런 기대를 낮추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과 위기는 속으로만 쌓여간다. 셋째, 사회의 관심은 청년과 노년에 쏠려 있다. 청년은 ‘미래’, 노인은 ‘복지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의제의 전면을 차지한다. 중년이 주목받을 자리는 애초에 비좁거나 늘 뒤로 밀려난다.
중년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정에서는 부모 돌봄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떠맡는 ‘샌드위치 세대’로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책임과 성과 요구가 정점에 달해 있으면서도 구조조정과 퇴직 위험이 늘 곁에 있다. 남성은 은퇴 뒤 고립되기 쉽다. 여성은 돌봄과 가사 노동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일쑤다. 복지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머문다. 청년은 취업과 주거 지원이, 노인은 연금과 돌봄 제도가 있다. 그러나 중년을 위한 맞춤형 제도는 드물다. 정책의 공백은 개인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압박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의 50대 남성 자살률은 10만명당 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40~50대 중년층이다. 중년 1인 가구와 황혼이혼도 빠르게 늘어, 사회적 단절이 심화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절반 가까이가 40~50대 가구주에게 집중돼 있다. 조기퇴직 뒤 재취업은 대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그친다. 수치 하나하나에 고단한 중년의 삶이 매달려 있다.
왜 지금 중년을 보호해야 하는가. 첫째, 중년은 한국 사회의 핵심축이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세대가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둘째, 세대 신뢰의 문제다. 중년이 기여에 비해 충분한 보상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불신하고 노인은 안정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중년은 예비 노년이다. 지금 이 세대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은 초고령사회에서 복지 비용을 줄이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확실한 길이다. 중년을 지키는 일은 결국 청년과 노년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중년은 개인적으로도 달갑지 않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작은 피로에도 버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마음 또한 흔들림이 많아진다. 별일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하루에도 몇번씩 기분이 달라진다. 집안과 직장, 어디서도 내 자리가 좁아지는 듯하다. 잘 살아왔는지 의문이 깊어진다. 자기 스스로도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시기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들에게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년은 여전히 사회를 담담하게 떠받치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무겁게 처진 어깨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버텨내는 모습에서 이들의 깊은 힘이 드러난다. 장년(壯年)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일상에서 주로 남성 중년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래는 한창 힘차게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었다. 무미건조한 ‘중년’보다 묵직한 ‘장년’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중년을 장년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길을 찾아야 한다. 세대 간의 믿음과 연대는 이런 노력에서 움튼다.
하루쯤은 중년에게도 눈길을 보내자. 그것은 방금 건너왔거나 곧 들어설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은가.

![<font color="#FF4000">[단독] </font>경회루 올라간 김건희, 근정전 안에도 들어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022/53_17610998887972_20251022501381.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쿠팡 ‘봐주기’ 오열한 검사 “도장 90도 꺾어 찍고” 양심선언 하기까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1021/20251021504074.webp)







![[단독] 이종호 “임성근 구명 부탁받았다” 첫 인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21/53_17610299619265_17610299439799_5917610299287012.webp)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은 5가지 이유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20/53_17609507306471_20251020503673.webp)
![[사설] 검사 눈물 폭로 ‘쿠팡 봐주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16/53_17606072209428_2025101650375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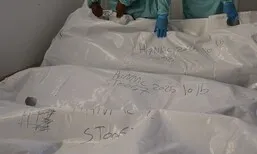







![[단독] 가해자 보호하는 ‘가정보호처분’…가정폭력 10명 중 3명만 형사처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17/53_17606516884265_20251016504274.webp)
![[단독] “성비위 검사가 성폭력 사건 맡다니”…불안에 떠는 피해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14/53_17603901186744_2025101350411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고궁 투어’ 김건희, 국보 223호 근정전 안에도 들어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1022/20251022501381.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경찰, 여고 앞 ‘평화의 소녀상’ 혐오 시위에 “집회 제한 통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022/53_17611044204643_202510225016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