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시절 다니엘과 데이트하며 ‘이 사람 보소’ 싶었던 건 그의 웃음소리였다. 입으로 씨익 웃는 미소 말고, ‘크크크’ 절제하는 웃음 말고, “으하하하하하” 박장대소하는 웃음. 같은 영상을 보고 있다가도 그는 엉뚱한 포인트에서 크게 웃곤 했다. 매우 웃긴 장면이 나와야 비로소 터지듯 웃는 나에 비해 그의 웃음 포인트는 더 자주,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발생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왔을까. 돌이켜보면 나를 비롯해 주변에서 그렇게 소리 내 웃는 어른을 본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어느새 크게 웃는 어른은 ‘실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해버렸고, 웃는 소리조차 다른 이에게 방해될까 조심하며 살아왔음을 새삼 깨달았다.
언제 한번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가 소리 내 웃자 누군가 흘깃 한두 번 눈길을 주었다(아마 다니엘 본인은 몰랐겠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예민한 건 나였다). 여긴 도서관도 아니고 영화관인데 웃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그 순간 문득 우리 공기 속에 스며든 ‘엄숙함’의 무게가 느껴졌다.
다니엘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요즘의 한국은 다른 서양 나라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된 것 같다고.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의 ‘정’에 반해 이 먼 곳으로 떠나왔던 그였기에 처음에 좋아했던 모습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꼈을 테다. 정과 오지랖의 경계를 넘나들다 ‘서로 조심하자’는 방향으로 흘러온 건 분명 바람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심성이 과해져 삭막함이 된 건 아닐까, 나 역시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font color="#FF4000">[단독] </font>경회루 올라간 김건희, 근정전 안에도 들어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022/53_17610998887972_20251022501381.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쿠팡 ‘봐주기’ 오열한 검사 “도장 90도 꺾어 찍고” 양심선언 하기까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1021/20251021504074.webp)







![[단독] 이종호 “임성근 구명 부탁받았다” 첫 인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21/53_17610299619265_17610299439799_5917610299287012.webp)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은 5가지 이유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20/53_17609507306471_20251020503673.webp)
![[사설] 검사 눈물 폭로 ‘쿠팡 봐주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16/53_17606072209428_2025101650375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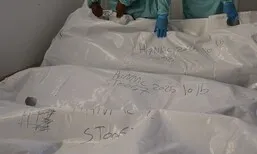







![[단독] 가해자 보호하는 ‘가정보호처분’…가정폭력 10명 중 3명만 형사처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17/53_17606516884265_20251016504274.webp)
![[단독] “성비위 검사가 성폭력 사건 맡다니”…불안에 떠는 피해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14/53_17603901186744_2025101350411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고궁 투어’ 김건희, 국보 223호 근정전 안에도 들어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1022/20251022501381.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경찰, 여고 앞 ‘평화의 소녀상’ 혐오 시위에 “집회 제한 통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022/53_17611044204643_202510225016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