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꽂이 / 마지막 도깨비 달이
도깨비? 요새 분위기에 맞지 않는 뚱단지 같은 말이다. 첨단 과학시대에 웬 도깨비냐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생소하게 받아들일 게 분명하다.
하지만 도깨비를 잃는 것은 단지 단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피양랭면집 명옥이〉 〈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등의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동화로 담아낸 작가 원유순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번에는 도깨비에 손을 댔다.
그가 그려내는 도깨비는 사람들을 겁주고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존재가 아니다. 보름달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과 상황에서 태어났다 사라지는 친근한 존재다. 사람들이 “도깨비다!” 하고 외치면 그 순간 도깨비가 태어나는 것이다.
책의 주인공 달이도 산골짝 오막살이에 살던 돌이가 계속 물속에 잠겨 일렁이는 보름달을 보고 “앗 도깨비다!” 하고 소리치는 통에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
그런데 푸른 숲에 모여 살던 도깨비들의 개체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도깨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도깨비들은 종족이 사라질까 두려워 긴급 회의를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도깨비를 믿을 만한 여유가 사라진 세상 현실을 확인할 뿐이다.

결국 한 마리의 새 도깨비도 더 탄생시키지 못한 채 세상 속으로 나갔던 도깨비들은 다시 푸른 숲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어느 순간 스물스물 다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달이만 남는다.
그때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난 도리깨 도깨비가 등장한다. 교통사고를 당해 산골로 요양왔던 아이 빛남이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두 도깨비는 다시 희망을 갖고 빛남이 같은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동화에는 도깨비들이 바라보는 비정상적인 세상의 모습도 날카롭게 그려져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지하철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 부모 손에 이끌려 억지로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도깨비 눈을 통해 그려낸 세상에 대한 풍자인 셈이다. 원유순 글, 김중석 그림. 디딤돌/9천원.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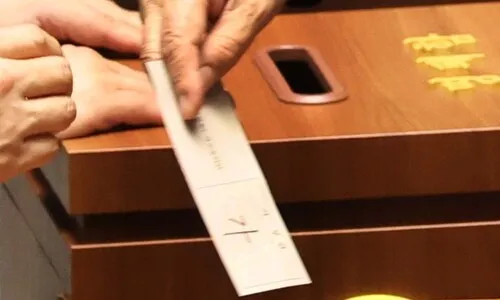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886595701_2025091150448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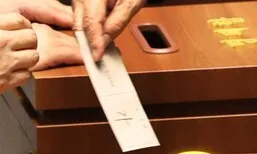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











![‘검찰당’에 또 수사권 주겠다는 말인가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807318319_20250911504131.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석방 한국인 귀국버스, 미 애틀랜타 공항 도착](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911/53_17575961529105_2025091150468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