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성 | 논설위원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되면 펼쳐지곤 했던 익숙한 비판과 반발 속에서 낯설게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다면, 서둘러 앞서가는 여당을 정부가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광경이다.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최적의 개혁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신중함인지, 아니면 개혁 대상까지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책임감인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늦추는 동안 입을 닫아 마땅한 검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하위 주제에 불과한 보완수사권이 다른 모든 이슈와 쟁점을 집어삼키는 작금의 상황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나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대배심’ 도입 등 검찰의 거대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화하는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 우려, ‘검경 간 핑퐁’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등 ‘무능하고 믿을 수 없는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핵심 주제가 되어버렸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데, 어느새 논점이 경찰개혁으로 옮겨 가버리는 마법. 숱하게 당해왔던 검찰(또는 친검 세력)의 ‘프레임 전환’ 기술에 또다시 당한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준비한 법안에 경찰 통제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아이오피시(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를 모델로 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경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감찰하고, 수사권 조정과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수위 신설에 뜻이 없어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수위 신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국수위 신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2900여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관 중 상당수를 공소청에 남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민주당 안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믿기 어렵다.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검찰의 역사를 벌써 잊은 것인가.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통령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성남에프시(FC)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실이 있고, 김학의 사건처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수두룩하다.
검찰에 수사권의 ㅅ 자도 줘서는 안 된다는 대중적 여론은 검찰이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현실의 반영이다. 검찰은 공정한 정의의 구현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힘의 사정기관으로서 돌격대 노릇을 해왔다. 검찰당, 서초당, 국민의힘 서초지구당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증거와 증언을 조작해서라도 재판에 세웠고, 급기야 ‘내란의 숙주’로서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집단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의 무능과 부패를 정말 우려한다면, 영국처럼 지역 경찰위원장(PCC·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을 선거로 뽑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된다. 피시시는 지역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예산과 정책을 통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자명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놔두고 다시 예전처럼 검찰이 지휘하도록 하거나 ‘전건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 편향의 복고주의에 불과하다.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 사건을 맡았다가 여론에 떠밀려 사임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는지 온몸으로 증명한다. 염치고 체면이고 모두 내던져버릴 만큼 막대한 판돈이 걸린 ‘범죄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1년 뒤면 검찰청 간판을 떼게 된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달라고 떼쓰는 이유는 시장의 절반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을 팔아 돈을 버는 법기술자들에 의해 정의가 왜곡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합법적 부패’ 관행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정권과 가까운 고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화 한통에 수십억원씩 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힘겹게 내란을 저지한 국민이 냉담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단독]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23일 심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2/53_17576631522544_20250912502454.webp)




![[단독] 윤석열-이시원·이종섭 통화, 박정훈 영장 기각 직후 새벽부터였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0912/2025091250198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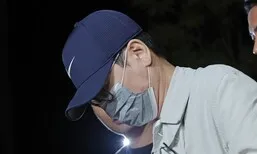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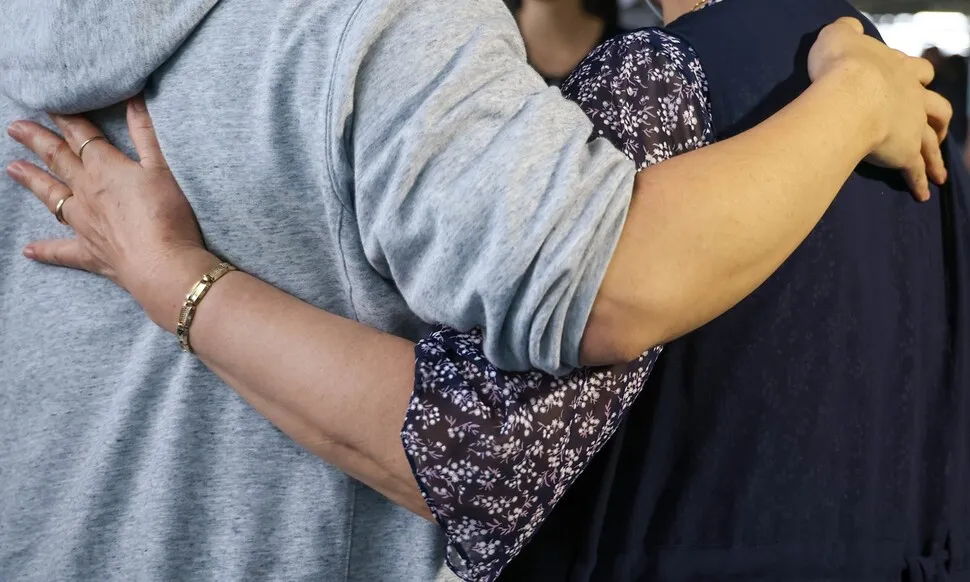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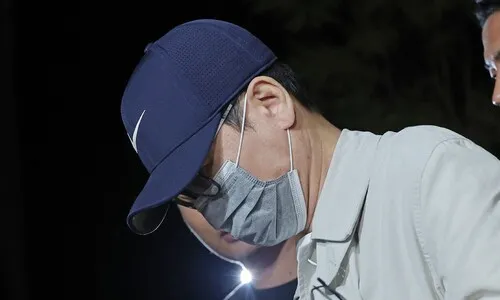





![<font color="#FF4000">[단독] </font>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23일 심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470/282/imgdb/child/2025/0912/53_17576631522544_2025091250245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