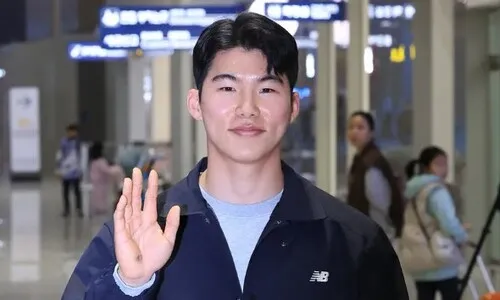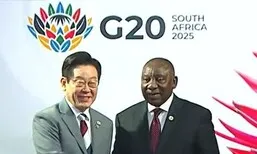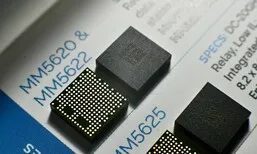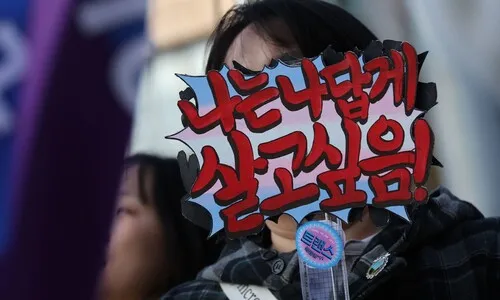오래전부터 연금학자들은 ‘연금 퍼즐’(annuitization puzzle) 현상에 주목해왔다. 노후에 자산이 고갈될 위험에 대비하는 합리적 선택인데도 사람들이 연금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애주기 가설’을 고안한 공로로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랑코 모딜리아니(1918~2003년)가 언급한 뒤로 관련 연구가 이어져왔다.
연금 퍼즐은 목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퇴직급여 운용에서도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대비 차원에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가입률은 전체 대상자의 53%(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다달이 연금으로 타는 이들의 비중은 높지 않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가운데 일시금 대신 연금 방식을 선택한 비중은 13%에 그친다.
일시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우선 자녀 결혼 비용에 쓰거나 상속으로 물려주려는 동기가 적지 않다. 또 자영업에 뛰어들기 위한 자금으로 쓰거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미리 받아서 쓰기도 한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계좌당 평균 수령액은 1억4694만원으로 일시금(1654만원)의 8.9배 수준(2024년)이다. 적립금이 적을수록 한번에 타 간 것이다.
새 정부가 퇴직연금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선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 국민연금(8.13%)에 크게 못 미친다. 대부분 연금사업자(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계약형’으로 운용되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개편안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혼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중도 인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셋째, 국민연금처럼 일괄 운용하는 기금형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편은 그간에도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진척이 없었다. 개인의 노후 종잣돈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퇴직급여가 노후소득의 또 다른 버팀목으로 기능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황보연 논설위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