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지난해 11월 저녁, 공연장 앞에서 떨고 있었다. 손에 넣은 티켓은 지인의 지인이 정가에 넘겨준 것이었다. 사정상 공연을 못 보게 됐지만, 취소했을 때 ‘업자’가 표를 가져가는 건 원치 않아서라고 했다. 공연장 입구에서 티켓을 품은 채 마스크를 눈밑까지 바짝 끌어올렸다. 입장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며 본인이 맞느냐며 물을 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니까. 긴장과 초조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공연을 보지 못하면 내가 굳어버릴 것 같았다.
그 기묘했던 감정은 말하기 어려웠다. 들킬까 불안했지만 무사히 통과하면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본인 확인 때 의심받지 않은채 입장한 뒤에야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렇게 뒤섞인 마음은 시시콜콜한 감정을 기록하는 SNS 팬 계정에도 쓸 수 없었다. 그건 말해선 안 되는 경험이고 감정이니까. 단지 그 때의 공연 사진만이 남았을 뿐이다.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본인 확인을 강화한 주최 쪽을? 인기에 비해 적은 좌석을 보유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었다는 가수를? 티켓팅에 실패해 이렇게까지 조마조마해야 하는 나 자신에게 가장 짜증이 났다.


![<font color="#00b8b1">[영상]</font> 57년 쓴 체어리프트 ‘투두둑’…수심 7m 호수에 추락 아수라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0/53_17548141088412_17548138400067_3617548138273733.png)



![[사설] 주한미군 ‘감축’ 언급한 미국, 의연히 대처하며 국익 지켜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173319057_2025081050186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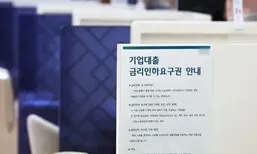
![[단독] 윤석열 대통령실, 구속 직전 우파 단체에 ‘대통령 벽시계’ 선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17548216529595_20250810501965.webp)
![[사설] 전한길 난장판 자초해놓고 뒤늦게 징계 나선 국민의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171691343_20250810501850.webp)
![[사설] 극우 지지자에 체포영장 저지 요청한 윤 대통령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167226881_20250810501848.webp)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브로커였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052540164_6417544438189611.webp)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050080529_20250808500084.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수심 43m 바닷속…‘조선인 136명 수몰’ 일본 해저탄광 문 열린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810/53_17548085429051_2025081050146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윤석열 대통령실, 구속 직전 우파 단체에 ‘대통령 벽시계’ 선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0/53_17548216409503_2025081050196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