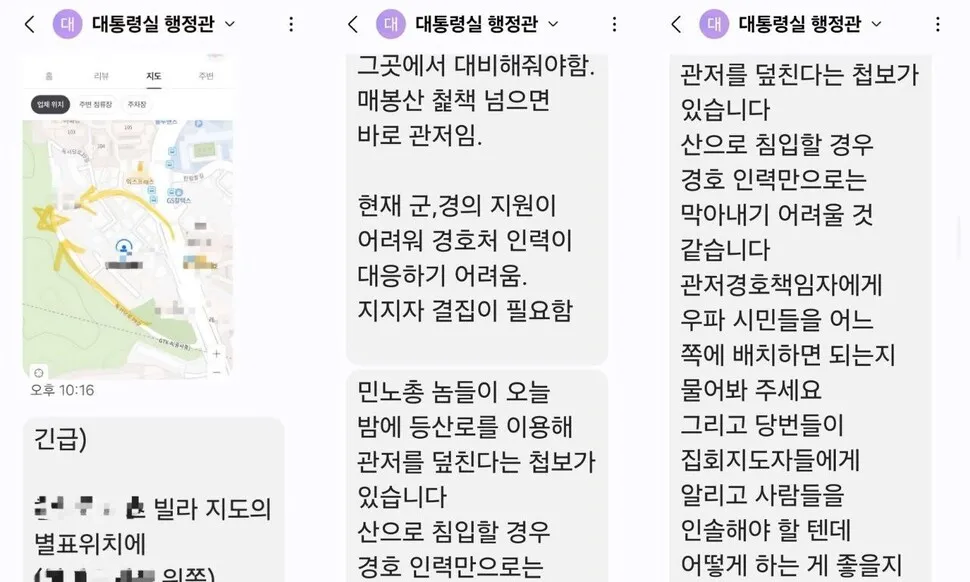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에 이르도록 ‘연명치료 중단’ 처치를 받은 김아무개(77)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지 이틀째인 24일에도 안정적으로 자발호흡을 했다. 김 할머니가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병원 쪽이 진작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되는 것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들은 ‘과잉 진료’ 책임을 물어, 지난해 병원 쪽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의료원은 이날 “김씨가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가쁜 수준인 1분에 16~19회 호흡을 하고 있지만 안정된 상태”라며 “가래 때문에 숨을 쉴 때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나며, 눈을 뜬 상태”라고 전했다.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곳만 응시하고 있으면 각막에 손상이 올 우려가 있어 눈에 거즈를 덮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목으로 들어가는 먼지 때문에 생기는 가래를 뽑아내고, 수액과 인공 급식을 하면서 변비를 막고 소화를 돕는 약을 투여하고 있다.
박창일 연세대의료원장은 “일반 뇌사 환자와 달리 호흡 중추 기능이 살아 있고, 16개월 동안 인공호흡기에 환자가 일부 적응을 해 자발호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안정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든 기도 흡입을 통한 폐렴, 갑작스런 심근경색, 심장발작 등의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며 “호흡을 계속해 생명을 이어간다면 2주에서 한 달께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3시간가량 생존할 것이라는 병원의 예측보다 김 할머니가 오래 생존하자, ‘인공호흡기를 이전에 뗄 수 있었는데 의료진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 쪽의 신현호 변호사는 “처음엔 호흡이 없었으니까 인공호흡기를 쓴 것이 맞지만, 한 달쯤 지나선 환자 스스로 호흡이 가능했는데 1년 넘게 인공호흡기를 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는데도 계속 생존하는 것을 보면 병원 쪽이 과잉 치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의료원은 “기관을 삽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떼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며 “의학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대법원이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에는 공감한다”며 “의료계만 모여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만든다는데, 가난한 이들이 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본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종교계·법조계·철학계 등 각계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jin21@hani.co.kr
















![[단독] “윤상현, ‘윤석열 뜻은 경선’이라 말했다”…특검, 명태균 진술 확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505718026_20250808502522.webp)
![[단독] 특검 “명태균, 윤석열 부부에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제공…2억7천만원 상당”](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17546442490826_20250808502402.webp)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050080529_2025080850008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