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마련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정부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복지부와 같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삼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대 사회의 부양관념을 반영하지 못한 전근대적 제도”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빈곤 관련 단체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동시에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보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도 논평을 내어 “국가가 최소한 맡아야 하는 의료 공공부조 대상이 미국의 10~12%(주마다 다름)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며 “이를 해결할 기본 조건이 부양의무제 폐지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나아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장제도의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넣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뒤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일부 가구에 국한해 폐지하는 등 사실상 완화하는 형태로 후퇴됐다. 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2015년 기준 추정치)에 이른다.
♣?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환영”
“기재부도 복지부와 같이 대통령 공약 이행할 노력 보여야”
인의협도 성명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 스마트 진료 반대”
- 수정 2019-04-25 11:39
- 등록 2019-04-25 11:39



![이 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소폭 반등…53.5%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06/53_17597113501922_20251003500745.webp)




![[사설] ‘보석 기각’ 윤석열, 이제라도 재판 성실하게 받아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02/53_17593957181983_2025100250327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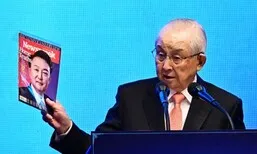
![[단독]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700여개 통화 녹취 삭제’ 정황 포착](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02/53_17593872216622_20251002502630.webp)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일본 기자들 ‘북적’…왜? [특검 완전정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006/53_17597054102764_2025100150480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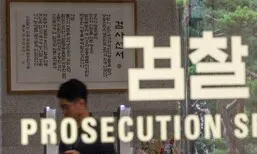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일본 기자들 ‘북적’…왜? <font color="#00b8b1">[특검 완전정복]</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006/53_17597054102764_20251001504800.webp)



![이 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소폭 반등…53.5%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006/53_17597113501922_2025100350074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