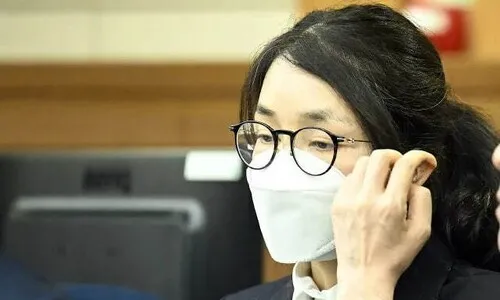“느린 염불 장단에 맞춰 엎드렸던 그가 서서히 일어서며 손끝에 늘어진 장삼을 허공에 뿌린다. 그의 기(氣)가 실린 장삼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힘차게 허공을 비상하곤 다시 살포시 내려앉았다. 장삼의 선이 곱다. 그 장삼은 인생의 수많은 고민을 품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그가 느리디느린 진양조 가락에 맞추어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버선코를 쳐들었다.”(<한겨레> 2014년 10월8일치)
‘한국 춤의 거목’ 이매방(본명 이규태) 명인이 7일 오전 9시15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
이 명인은 여성보다도 더 여성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그래서 그의 춤 철학은 ‘고운 마음’에서 출발한다.
1927년 전남 목포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대까지 세습무를 해온 집안이다. 할아버지 이대조는 목포권번(기생들의 조합)에서 승무와 고법을 가르치던 명무·명고수로 호남 일대를 쩌렁하게 울리던 명인이었다. 7살 된 이 명인의 귀에 옆집 사는 함국향 목포권번 권번장의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태도가 곱고 용모도 빼어나니 권번에 가 춤을 배우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 명인은 권번에서 검무, 승무, 법무를 차례로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5년간 중국에 살면서 전설적 중국 무용가인 메이란팡(1894~1961)에게서 칼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메이란팡은 경극 <패왕별희>를 만든 이로, 영화 <매란방>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열다섯살 때 우연히 판소리 명창 임방울의 공연에서 승무를 추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승무와 살풀이춤을 비롯해 입춤, 검무, 장검무, 장고춤, 사풍정감, 초립동, 승천무, 대감놀이, 기원무, 보렴무, 고무, 소고춤, 사랑가, 화랑도, 한량무, 신선무, 춘향전 등 19종의 춤을 췄다.
생존 예술가 중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1987년)와 제97호 살풀이춤(1990년) 등 두 분야의 예능보유자였다. 호남춤을 통합해 무대양식화한 ‘호남춤의 명인’으로 불린다. 목포권번의 춤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의 승무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형 승무’로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욕(忍辱)의 세계를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살풀이춤은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춤으로 정적미의 단아한 멋과 정과 한이 서린 비장미를 함께 갖추고 있다. 1960년대 삼고무, 오고무, 칠고무 등 일종의 북춤인 고무를 비롯해 검무, 기원무, 초립동 등을 직접 창안해 그만의 춤세계를 구축했고, 200여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지난해 8월에는 여든일곱살의 나이로 제자들이 연 ‘우봉 이매방 전통춤 공연’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호남 기방예술의 정통계보를 잇는 ‘입춤’을 추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명자(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씨, 딸 현주(이매방춤 이수자)씨, 사위 이혁렬(이매방아트댄스컴퍼니 대표)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30분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사설] 폭탄주, 명품 수수, 왕 놀이...윤석열·김건희 권력 사유화 제대로 단죄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7/53_17625080577478_20251107502648.webp)









![[속보] 대통령실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팩트시트 다음주 이후에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7/53_17625002922201_20251107502251.webp)







![[사설] 울산화력 매몰사고, 공공기관조차 중대재해 속수무책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7/53_17625082677427_2025110750263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