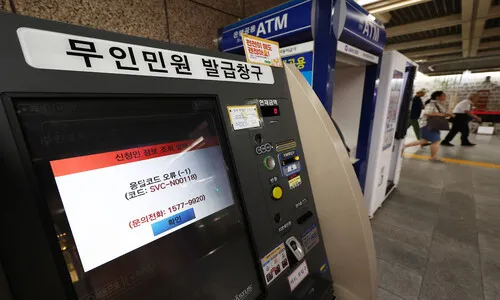고금변증설 /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경상남도 마산시 현동 장지연 묘소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장지연로’라는 도로표지판이 10년 만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4월30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장지연을 친일파로 최종 발표하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산시에 ‘장지연로’ 명칭 철회와 도로표지판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마산시가 받아들인 것이라 한다.
기사를 읽고 약간의 개인적 소회가 있었다. 나는 1985년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었다. 근대계몽기와 일제시대 초기의 한문학에 관심을 두고 이 시기의 신문과 잡지를 읽는 것이 나날의 일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격인 <매일신보> 영인본을 읽던 어느 날 뜻밖에도 ‘시일야방성대곡’의 필자 장지연이 엄청난 분량의 글을 이 신문에 기고한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때 ‘시일야방성대곡’의 분출하는 애국주의에 감동을 먹었던 20대 후반의 열혈 우국(?) 청년이라 장지연이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 협조한 글들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고민 끝에 장지연의 친일적 시와 산문을 정리하고 논문을 써서 학계에 보고했다.
논문을 쓰고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장지연이 사망한 것은 1921년이다. 장지연은 1914년 12월23일부터 <매일신보>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1918년 7월11일의 글을 마지막으로 더는 기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7월11일부터 불과 7달 뒤에 3·1운동이 일어난다. 장지연이 3·1운동 때에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짐작할 자료가 없었다.
의문은 논문 발표 이후 영인본으로 간행된 그의 일기를 읽고 풀렸다. 일기는, 1919년 1월에서 4월, 1920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일기인 ‘위암일기’, 1920년 12월부터 1921년 4월까지의 일기인 ‘일기속’(日記續)이 남아 있다. 이 일기에서 매일신보사를 떠난 이후 장지연의 만년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개 마산의 향리에서 지내면서 가까운 친지를 만나 어울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다. 다만 특기할 것은 음주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 마셨다 하면 만취에 이르는 그의 음주벽은 <매일신보>의 고정필자로 있을 때부터 유명한 것이었다. <기려수필>의 저자 송상도는 장지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21년 가을 나는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여론이 장지연이 술에 빠져 취해 있는 것을 비난하였다” 장지연은 말년을 취생몽사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57살이란 이른 나이에 사망한 것도 술병 때문일 것이다.
이제 3·1운동 즈음의 ‘위암일기’를 읽어보자. 장지연의 연보에 그는 3월에 마산 월영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4월에는 양산을 유람했다고 되어 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다. ‘위암일기’도 동일하다. 절반 이상의 날이 아무런 기록이 없다. 3·1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단 이틀뿐이다.
21일, 금요일. 맑다. 마산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른 일로 체포된 사람이 수십 명이다.
26일, 수요일. 맑다. 마산시장에서 또 남녀 학도와 군중이 소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조선 민중의 항쟁에 장지연은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고, 또 어떤 생각도 정서적 반응도 남기지 않았다. 장지연은 <매일신보> 지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총독부의 조선 통치에 협력하였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의 말을 끌어와 조선 사람은 단결성이 없는 인종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일찍이 들으니 이등박문 공이 말하기를, ‘한인은 단체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대개 공이 오랫동안 한국에 있어 한국인의 습성에 아주 익숙한 까닭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어찌 한국인의 병통을 깊이 맞힌 것이 아니랴. … 오호라, 동종동족(同種同族)이 서로 원한을 맺어 서로 원수가 되어 망국의 지경이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으니, 어찌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니랴. 이로 인해 전 조선인의 습관이 되어 마침내는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랴. 아아! 슬프도다.(‘송재만필 松齋漫筆’(9), <매일신보>, 1915년 12월26일치 1면)
장지연은 조선 사람은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라 믿었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폭력을 동원해 강요했던 식민지적 근대화가 조선을 진보·발전시킨다고 믿고 그것을 선전했다. 하지만 그 단체성이 없다는 조선의 민중은 일제의 압박에 3·1운동으로 반발했다. 장지연으로서는 실로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의 필자로 애국적 필봉을 휘둘렀던 그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기미독립선언서의 33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3·1운동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술에 빠져 살다 결국 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도,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정신적 파탄의 결과일 것이다.

23년 전 <매일신보>에서 장지연의 이름을 보았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애국적 언론인으로서 교과서에 실려 만인의 존경을 받다가 이제 친일이란 불결한 형용사를 이름 앞에 붙이게 된 장지연의 비극이 너무나 안타깝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 서울광장의 촛불집회를 보고 한국 사람은 주체성이 없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 촛불을 켠다고 말하는 언론인도 있다.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뒷날 언론인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자못 궁금하다.
강명관/ 부산대 교수(한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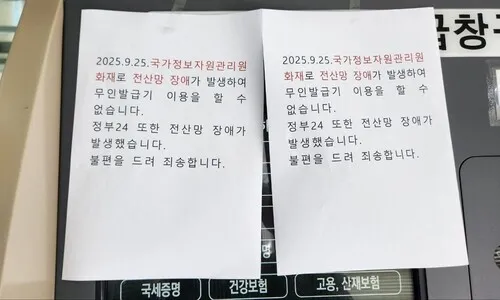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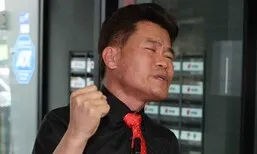







![[단독] 박진 전 장관 “이종섭 임명, 윤 대통령 뜻이라 거부 못 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5/53_17587942517055_20250925503898.webp)


![[단독] 양평군, 김건희 오빠 ‘휴경 농지’ 알고도 2년째 방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6/53_17588648758918_20250926502227.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6/53_17588916889001_20250926503132.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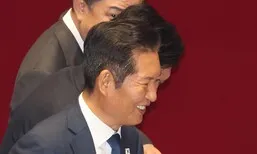






![가을밤, 하늘에 피어오른 수천송이 꽃 <font color="#00b8b1">[포토] </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7/53_17589768998591_2025092750086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