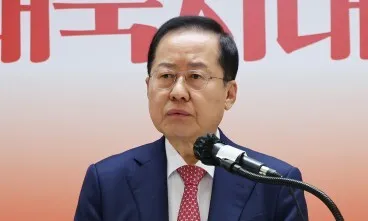계획된 불평등
마리 힉스 지음, 권혜정 옮김/이김·2만2000원영국 드라마 <블레츨리 클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해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여성들이 다시 모여 연쇄살인마를 추격하는 이야기다. 뛰어난 논리력과 분석력을 갖춘 주인공들은 전쟁이 끝난 후 전업주부, 웨이트리스, 도서관 사서로 살아간다. 이들은 ‘여자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경찰을 설득하다 못해 결국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는데, 전문가로서 주인공들의 진가가 발휘될수록 그들이 속한 가정과 영국사회는 이 똑똑하고 용감한 여성들의 손발을 묶고 숨통을 조이는 감옥처럼 보인다.
그런데 역사학자 마리 힉스가 집필한 <계획된 불평등>에 따르면, 드라마 주인공들이 겪는 답답한 일들은 시대를 잘못 만난 소수의 뛰어난 여성들이 겪은 개인적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작은 마을 블레츨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 암호해독 작전을 수행한 현장이자, 프로그래밍 가능한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콜로서스’가 탄생한 곳”이다. 수천 명의 영국 여성들이 이곳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영국정부는 여성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인 가정으로 돌려보내면서 ‘비밀유지 각서’라는 족쇄를 채우고 역사에서 지워버렸다.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 전산화’ 과정에선 숙련된 여성 전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남성들에게 산업의 주도권을 쥐여주는 정책을 폈다. 저자는 이런 “전산노동의 ‘성별화’와 ‘탈숙련화’가 콜로서스 개발로 한때 세계 정상을 자랑하던 영국 컴퓨터산업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한다.

윈스턴 처칠은 블레츨리 노동자들을 “황금알을 낳았지만 꽥꽥거리지 않는 거위”라고 묘사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영계’들로 공장을 돌리면서 수탉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직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취급됐고 사회는 “핵가족을 먹여 살리는 남성 가장의 급여를 중심으로” 조직됐다.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다 본업인 가사노동을 잠시 미뤄두고 ‘가정의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출근했으므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

정부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런던을 중심으로 사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자 이번엔 중산층 미혼 여성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탁상용 계산기나 타자기를 두드리는 단순기술직은 남성들에겐 적절치 않은 반면 결혼 전까지 가족의 생계를 도우려는 중산층 여성들을 위한 점잖은 일로 권장됐다. 방직공장 노동자들처럼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 역시 “가장인 남성에 비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경영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업무를 성별에 따라 나눠 조직해 노동의 계급구조를 만들고 ‘여성의 일’을 맨 밑바닥에 깔면” 동일노동이 아니므로 동일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사무실에서 다루는 기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숙련도가 업무의 효율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는데도 결혼과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치부하던 영국사회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컴퓨터와 이를 개발하고 운용할 기술직이 미래를 이끌 중요한 성장동력임을 깨닫는다. 중요한 일은 남성의 몫이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젊은 남성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조작을 총괄할 기술관료 엘리트 계급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됐다. 그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프로그래머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영국을 세계 컴퓨터산업의 종주국으로 이끌 신입 남성 프로그래머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그의 부하직원이 됐다. 이미 숙련된 인력을 배제하고 굳이 신규 인력을 양성하느라 어영부영하는 사이, 아이비엠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고 영국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미경 자유기고가 nanazaraza@gmail.com



![대중교통 ‘케이패스’ 개편…월 6만원 내면 20만원까지 이용 [2026년 예산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9/53_17564337632588_2025082950102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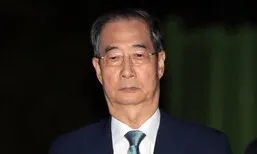



![바싹 갈라진 저수지엔 흙먼지만 폴폴…비는 기약이 없고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8/53_17563714813911_2025082850370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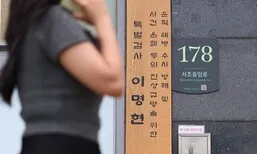

![[사설]‘대통령 행세’ 김건희 구속 기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단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9/53_17564602095648_20250829502397.webp)


![지구인들을 웃고, 울고, 떨리게 한 이 주의 장면들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30/53_17565136576699_2025082950261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