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원전 6세기 전반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5세기 후반 소크라테스 이전까지 활동한 이들을 통상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초기 희랍철학자들’)이라고 부른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적으로 이들 바로 뒤를 따른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한 탈레스, 수학자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을 제기한 제논, 최초의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 등이 이 시기에 활동한 자들이다. 이들이 주고받으며 전개한 담론이 철학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다. 책은 바로 이 시기 이들이 주고받은 ‘설득과 비판’이 기성의 문화적 권위와 어떤 식의 긴장 관계를 이루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담론 전통을 만들어 나갔는지를 조명한다. ‘설득과 비판’은 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파르메니데스가 인상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초기 희랍철학자들의 저술은 제대로 보존된 것이 없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이들의 저술에서 후대 학자들이 인용 기록한 직접전승 자료와 이들의 생애나 행적 등에 관한 후대의 증언과 기타 확실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간접전승 자료뿐이다. 이 직간접 전승 자료를 뭉뚱그려 ‘단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온전한 저술이 아니라 조각난 단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책을 보다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앞뒤 문맥의 도움으로 이해를 시도하는데, 단편만 남은 초기 희랍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앞뒤 문맥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단편들을 문맥의 도움 없이 직접 해석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주관적 해석으로 간접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의 경우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단편이나마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대체 왜 이 철학자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힘들 수밖에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해는 쉬울 수 있겠으나 그 누군가의 주관적 해석이 과연 원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책은 이 두 방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술 방식을 채택한다. 저자 강철웅은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초기 희랍철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파르메니데스로 국내 학자들 중 유일하게 박사학위논문을 취득한 전문가다. 그는 전해지는 단편을 하나하나 인용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논리적 비약에는 지나치리만큼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거의 매 문장마다 단편들 간의 간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메워준다.
20세기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역사를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규정하는데, 사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에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이 놓여 있다는 것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서양 철학을 이해하려면 플라톤을 알아야 하는데, 플라톤을 알기 위해서는 파르메니데스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초기 희랍철학의 역사를 파르메니데스라는 큰 물줄기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갈라져 나온 종합과 계승의 역사로 해석하려는 시도다. 필자가 아는 한 서양에서조차 파르메니데스를 정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사상의 연속성과 계승을 해명한 작업은 없었다.

저자가 강조하는 ‘담론’이란 발견된 진리를 “내외부로 전달(설득)하고, 전달된 진리를 검토(비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담론전통을 중심으로 전개된 초기 희랍철학의 역사는 진리 “내용”보다 진리가 공유되는 다양한 “형식”에 주목한다. 로고스는 ‘논변’(근거제시)으로 뮈토스는 ‘이야기’로 해석되며, 전달의 수단으로서 ‘설득’, ‘증명’, ‘증거’, ‘주장’, ‘논증’, ‘필연’, ‘(자기)반성’, ‘대화’ 등의 제반 개념들이 초기 희랍철학의 담론전통을 구성한다. 등장하는 시인들과 철학자들 각자의 진리 내용도 꼼꼼하게 다루지만, 이들 간의 연속성은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 확보된다. 이런 맥락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어려웠던 두 가지, 파르메니데스에게 ‘설득’과 ‘진리’가 동렬에 놓인다는 주장과 ‘설득’과 ‘진리’가 소피스트에 이르러서야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재민 가톨릭관동대 VERUM교양대학 교수

![선출되지 않은 팬덤권력 김어준 [세상읽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25561924_20250923503778.webp)
![“안창호 위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75825476_20250923504069.webp)



![[속보]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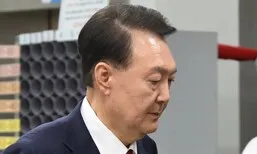




![[단독] “김용원 태도 변화 감지됨”…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메모 특검에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01270863_20250923503714.webp)

![[단독] 통일교 전국 교구장, ‘한학자 구속’ 첫 입장 표명…“지도부 사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82754446_20250923503905.webp)
![[단독]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5639958_20250923504035.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4대강 사업 뒤 생긴 녹조 74%가 낙동강서 발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3662263_2025092350403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