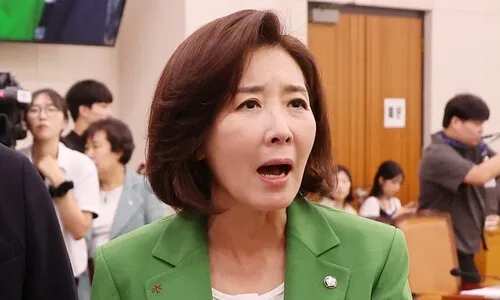인간의 길을 가다
장 지글러 지음, 모명숙 옮김
갈라파고스·1만8000원
한국의 대학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들 중 하나로 꼽히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지은이 장 지글러의 ‘인문학적 자서전’. 스위스 출신의 상층 인텔리 계급인 그가 왜 82살이 된 지금까지 기득권과 신변에 가해진 위협까지 감내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의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면서 여전히 만연해 있는 굶주림 문제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맞서 싸워왔는지, 그 이론적·철학적 배경이라 할 자신의 인문학적 체험과 사유들을 자전적 회고 형식으로 담아냈다.
스위스 제네바대학과 프랑스 소르본대학 교수를 지냈고, 18년간이나 스위스 연방의회 의원(사민당)으로, 또 8년간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도 활동하면서 <탐욕의 시대> <빼앗긴 대지의 꿈>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들> <왜 검은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등 많은 책을 써낸 이 사회학자는 스위스 은행가들의 증오를 사 피해보상 요구액이 수백만 스위스프랑에 이른 9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연방의회 의원 면책특권까지 빼앗겼다. 책은 그럼에도 초지일관한 그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말년에 그 대답으로 내놓은 지적·사상적 배경 종합 정리요, 자기 정당성 옹호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책에서 지글러가 등장시키는 수많은 학자·사상가들 중의 한 사람인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1930~2002)는 이렇게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정복의 무기다. 그것은 모든 저항이 무의미해 보이는 경제적 숙명론을 선포한다. 신자유주의는 에이즈와 같다. 그것은 우선 희생자의 방어체계를 공격한다.” 부르디외는 ‘세계화’가 필연적인 경제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을 탈정치화하고 경제세력들을 ‘해방’시켜 시민과 정부를 그 해방된 경제법칙에 따르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숙명 같다는 인상은 지속적인 선전의 결과”라고 얘기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세뇌’ 탓으로 여긴 부르디외에게 지글러는 “경제의 자연화, 즉 경제를 자연의 힘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망상이 가진 최후의 술책”이라며 맞장구친다.
그가 자신의 책들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온 ‘야만적인 세계질서’를 한눈에 실감케 하는, 양극화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들은 이 책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글러는 자신의 사상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지적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말한다. “나는 누구의 상속자인가? 누가 내 사상에 자극을 주었고, 또 계속 자극하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 그리고 나와 동행했고 여전히 동행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과 일치하는 지점이 어디이고 그렇지 않은 지점이 어디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막스 베버가 독일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아 ‘독일 대학의 비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지글러는 이 책에서 볼테르, 루소, 마르크스, 루카치, 그람시, 뒤비, 호르크하이머, 애덤 스미스, 리카도, 케인스 등 숱한 선학들을 호출해서 논하고 비평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Q&A]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13/53_17577182846009_20250913500157.webp)


![[Q&A]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3/53_17577182846009_20250913500157.webp)



![[단독]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23일 심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2/53_17576631522544_20250912502454.webp)




![[단독] 윤석열-이시원·이종섭 통화, 박정훈 영장 기각 직후 새벽부터였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0912/20250912501980.webp)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