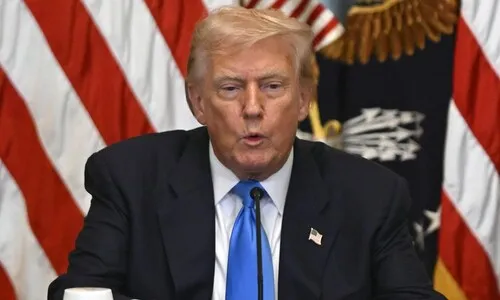김성중(사진)의 두번째 소설집 <국경시장>에는 ‘자전소설’로 발표된 단편 <한 방울의 죄>가 들어 있고 거기에는 “내가 만난 최초의 이야기꾼” 희정의 이야기가 나온다. 열한살 무렵 같은 아파트 상가 동무였던 희정은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로 또래들을 사로잡았고 “거짓말이 탄로 날 즈음 더 크고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맹랑한 거짓말쟁이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환상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은 화자가 한참 더 나이 든 뒤에야 깨닫게 된 진실이다. “없는 잠옷과 없는 어머니, 그밖에 부재하는 모든 세계를 자신의 힘으로 채워넣기 위해, 공란이 그렇게도 많은 어린 삶을 방어하기 위해 숱한 거짓말을 발명한 것이다.”
어느 정도는 소설이란, 더 나아가 문학이란 어린 희정의 거짓말과 다르지 않은 근원과 속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불우하고 부족한 현실의 틈을 가공의 진실로 메꾸고자 하는 바느질이 곧 문학 행위가 아니겠는가.
같은 작품에서 화자는 등하굣길에 인사를 드렸던 아저씨가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면전에서 그를 무시했던 ‘죄’를 털어놓는데, 이 일화의 핵심은 정작 다른 데에 있다. 소설 속 현재인 지금 그 일화를 자전소설로 풀어 내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일단 이야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언어는 알아서 자기 자리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고 어느 부분에 윤을 낼 것인지, 혹은 어둡게 처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 작가에게 통보한다. 종이 끝에서 헤아려 보니 이 글은 처음부터 패퇴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 대목은 어쩐지 표제작의 주인공들이 놓인 처지를 상기시키는 느낌이다. 이국의 접경 지역을 무대로 한 <국경시장>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사고자 기억을 화폐 삼아 지불한다. 그들이 좇는 가치란 쾌락과 몽상 같은 것들인데, 기억이 과거라는 단단한 현실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면 그 반대급부인 이미지와 감각은 매혹적이되 부황하기 짝이 없다. 소설 끝에서 주인공들이 맞닥뜨린 곤경은 뿌리 없는 환상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영화 <박하사탕>처럼 시간 순서와 반대로 서술되는 단편 <에바와 아그네스>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작가 쪽의 안간힘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의 변덕과 부침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유지되는 두 주인공의 우정의 첫 자리를 소설 말미에 배치함으로써 작가는, 환상의 부력과 원심력이 어디까지나 현실의 중력과 구심력의 자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최재봉 기자


![<font color="#FF4000">[단독]</font> “스테이크 굽기까지 지시”…호놀룰루 총영사 부인 갑질·폭언 신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731/53_17539173813505_20250730504120.webp)








![[사설] ‘윤 어게인’ 전한길이 국민의힘 상왕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0/53_17538661557538_20250730503644.webp)


![‘신천지 대선경선 개입설’ 휩싸인 국힘…홍준표, 뒤늦은 폭로 이유는? [공덕포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0/53_17538766784839_20250730503908.webp)
![[속보] 특검, ‘채 상병 조사 기록 회수’ 이시원 전 비서관 소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1/53_17539228386555_6717539227137646.webp)


![[사설] 안이한 조처에 스토킹 비극, 피해자 보호책 시급하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0/53_17538680942056_20250730503666.webp)



![노란 색 지우기? [한겨레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0/53_17538726997774_20250730503845.webp)
![[사설] 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하는 과잉 불안 조장 멈춰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0/53_17538682504459_20250730503672.webp)






![[일문일답]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끝까지 12.5% 주장했지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731/53_17539255214169_9917539176086043.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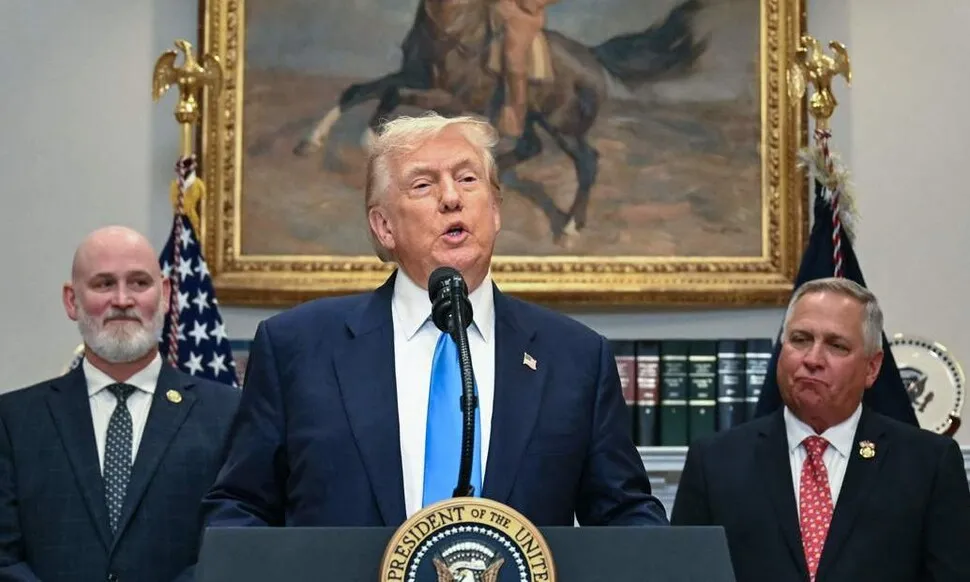
![<font color="#00b8b1">[일문일답]</font>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끝까지 12.5% 주장했지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731/53_17539255214169_991753917608604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