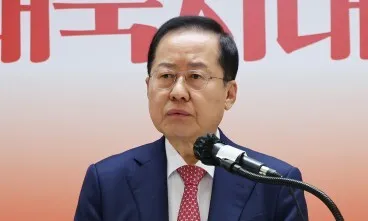우리를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시장맹신 자본주의체제야, 라고 마이클 페럴먼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말한다.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가>(2010)의 원제는 ‘The Invisible Handcuffs of Capitalism’, 즉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수갑’이다. 자본주의체제의 이론적 창도자라 할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살짝 비튼 말이다.
알다시피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마술을 이렇게 그렸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양조장의 주인, 또는 제빵업자의 자비심 덕이 아니다. 그 사람들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다.” 각자 이기적 욕망대로 움직이면, 세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저절로 잘 굴러갈 거라는 이 마법의 주문을, 미국의 진보 저널 <먼슬리 리뷰>가 펴낸 <무엇이 우리를…>은 보이지 않는 수갑(족쇄)이라고 뒤집어 버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스미스적 천국인가, 페럴먼적 지옥인가?
자본주의체제에서 수갑을 차야 하는 대상은 늘 노동과 노동자, 노동조건이다. 페럴먼은 이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 속의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객들을 붙잡아 자신의 철제 침대에 눕히고는 그 길이에 맞도록 억지로 늘이거나 잘라내며 가혹하게 죽였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자신의 몸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침대는 보이지 않는 수갑으로 대체된다.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시장경제 작동 전제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도덕적 자제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봤던 스미스는, 오늘의 신자유주의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양질이었다고 페럴먼은 얘기한다. 물론 스미스의 도덕적 자제력이란 현실적으로는 양두구육의 자기모순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거릿 대처는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은 없다”고 했고,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도 대처의 추종자들이다.
대처의 프로크루스테스적 전략을 당시 어느 서방 기자는 이렇게 비꼬았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약간 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사회적 안전망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라. 돈 버는 행위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모든 활동의 위상을 낮춰라. 예술가들에 대한 기사 작위 수여를 중단하고 그것을 백화점 재벌들에게 주어라. 지식인들 말 듣는 걸 중단하고 기업가와 금융업자들의 말을 경청하라. (…) 돈 잘 버는 사람들은 (…) 이윽고 (…) 지배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
페럴먼은 말했다. “금융 스캔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몇몇 ‘썩은 사과’가 연루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상류층 사회 내부에는 단지 몇 개의 썩은 사과들만 존재하는 반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엄중한 규율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세상의 어느 누가 왜 믿어야 하는가?” 세월호와 국정원과 간첩 날조사건과 북방한계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대중교통 ‘케이패스’ 개편…월 6만원 내면 20만원까지 이용 [2026년 예산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9/53_17564337632588_2025082950102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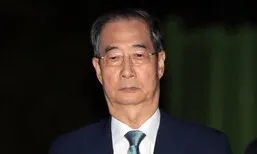



![바싹 갈라진 저수지엔 흙먼지만 폴폴…비는 기약이 없고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8/53_17563714813911_2025082850370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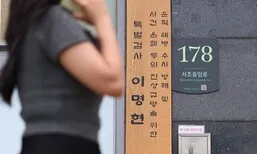

![[사설]‘대통령 행세’ 김건희 구속 기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단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9/53_17564602095648_20250829502397.webp)


![지구인들을 웃고, 울고, 떨리게 한 이 주의 장면들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30/53_17565136576699_2025082950261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