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버릇처럼 흔히 쓰는 문장에 뜻밖에 결정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때가 있다. 감당하기 힘든 온갖 임무를 자식에게 부과한 뒤 “이게 다 널 위한 거야”라고 읊조리는 부모들의 어법이 그렇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이게 뭐 나 좋자고 하는 짓이냐” 같은 말들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를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자식의 탁월함이 곧 부모의 업적이자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버린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식도 부채감을 내면화한다. 나 때문에 애쓰시는 부모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부담감. “성적 오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라는 식의 어법도 사랑을 매사에 조건부로 만든다. 조건부 상벌의 습관을 내면화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사랑이란 조건과 조건 사이의 은밀한 교환인가? 내 성적표가 엄마 아빠의 자부심과 비례하는가? 정말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이란 말인가?
이렇게 타인의 요구를 자신의 욕망보다 중시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요구에 끼워맞추는 심리를 ‘공의존’(codependency)이라 부른다. 공의존은 일종의 중독이다. 알코올중독이나 니코틴중독과 달리, 공의존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 중독되는 것이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이 날 사랑해주실 거야. 내가 돈을 잘 벌어야 가족들이 날 인정해줄 거야. 내가 없으면 그는 하루도 견디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관계와 보상에 대한 심각한 중독은 일종의 정체성처럼 신체에 각인된다. 급기야 그 중독이 없어지면 진정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관계에 중독되는 것은 타인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다가 정작 자기 마음의 생김새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공의존의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업적도, 너의 영광도, 너의 인생도 내 것이다. 난 뭘 줄 수 있냐고? 난 너에게 사랑을 주잖니! 이 끔찍한 공의존은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심각한 공의존은 자식의 영혼을 황폐화시킨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던 카프카.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원치 않는 법학도의 길과 보험회사 직원의 길 위에서 좌절한다. 늘 ‘대단한 너’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아버지와의 싸움이 자기 존재를 삼켜버릴까 두려웠다.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전 늘 더듬거리게 되고, 결국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소파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카프카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아버지에게 결코 통째로 내드릴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존재 증명을 해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의 ‘대’에서 이루려는 욕심이야말로 어떤 독약보다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아들의 심장을 찌른 것이다.
부모의 보상심리와 자식의 영웅심리가 딱 맞아떨어질 때, 공의존의 사슬은 비로소 완성된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 부모가 ‘난 너만 보고 산다’는 부담스런 ‘사인’을 보내지 않을 때, 네가 네 인생 살듯 나도 내 인생 살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자식들은 공의존의 사슬을 끊고 진짜 어른이 된다. 공의존은 물론 사랑의 한 형태다. 하지만 분명 억압의 형태이며, 중독의 형태이기도 하다. ‘이게 다 널 위해서다’라는 공의존의 덫은 결국 ‘이게 다 부모님 탓이야!’라는 심각한 원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에서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더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 ‘난 널 사랑해’의 방점은 ‘나’가 아니라 ‘너’니까. 마침내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랑해’ 자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놓아주자. 눈치보지 말고, 내 인생을 실컷 살자. 마침내 더 큰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정여울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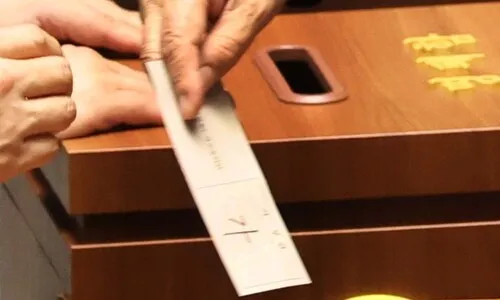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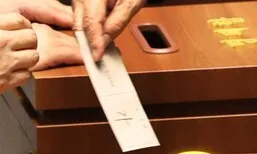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











![‘검찰당’에 또 수사권 주겠다는 말인가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807318319_2025091150413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