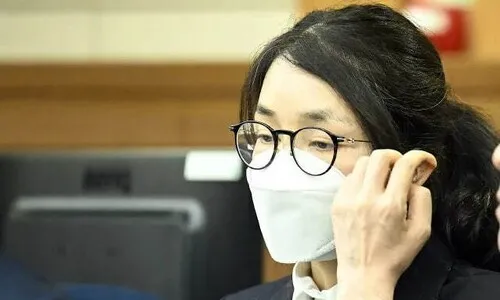영화 <매트릭스> 흥행 이후 영화와 철학은 잘 어울리는 친구 같다. 때론 철학이 영화를 이끌고, 어느 순간에는 영화가 철학의 든든한 뒷배가 된다. <청춘의 고전>이 두 장르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은 좀더 ‘자극적’이다. “처음에는 이단이었거나 금서”였던 고전 10권과 “위험한 영화” 10편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영화 <인셉션>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으로 설명한 박영욱 숙대 교수의 글 ‘생각을 훔치는 사회’다. 사실 꿈을 조작하는 영화 <인셉션>의 발상은 프로이트적이지 않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바탕을 두며, 곳곳에 꿈 이론을 설명하는 요소들이 등장한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까지도 한데 묶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와 철학의 매력인 셈이다.
<장자>와 <쿵푸 팬더>를 씨줄 날줄 삼아 이야기를 풀어낸 박영미 한양대 외래교수의 ‘현실이 진짜일까?’는 읽는 재미가 남다르다. <장자>에 웬 <쿵푸 팬더>냐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다. 하지만 명쾌한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쿵푸 팬더가 ‘위험한 영화’임을, 그것이 어떻게 호접몽과 잇닿아 있는지 깨닫게 된다.
‘고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제로 삼아 김시천 경희대 연구교수는 <도덕경>과 영화 <황후화>를 연결시킨다. 이정은 연세대 인문학 연구원은 헤겔의 <법철학>과 영화 <본 아이덴티티>를 마주 놓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문’에 대해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현남숙 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과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통해 문화가 산업이 되면서 야만적 대중을 생산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복기한다.
<청춘의 고전>이 철학과 영화의 만남을 주선하는 궁극적 이유는 현대인들과 고전·철학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다. <청춘의 고전> 저자들은 객관적인 고전 읽기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면서, 읽는 이의 무한 자유를 선포한다. 고전과 철학은 무조건 좋다는 맹목적 편견에도 도전한다. 그것이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만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과 영화의 만남을 주선하면서도 그것이 가진 가치와 현실 적용 능력을 상승시키는 책이다.
장동석/출판평론가
[화보] 함께 숨쉬는 모든 동물과 가까이






![[사설] 폭탄주, 명품 수수, 왕 놀이...윤석열·김건희 권력 사유화 제대로 단죄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7/53_17625080577478_20251107502648.webp)









![[속보] 대통령실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팩트시트 다음주 이후에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7/53_17625002922201_20251107502251.webp)







![[사설] 울산화력 매몰사고, 공공기관조차 중대재해 속수무책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7/53_17625082677427_2025110750263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