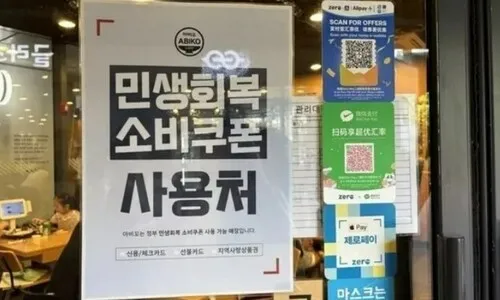로기완을 만났다
조해진 지음/창비·1만원
“처음에 그는, 그저 이니셜 엘(L)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로기완이라 불리며 1987년 5월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리 제7작업반에서 태어났습니다.”
조해진(35)의 두 번째 장편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는 이 두 문장 사이에 놓여 있다. 소설 화자인 방송작가 출신 ‘김’이 벨기에를 떠도는 탈북인에 관한 기사를 근거로 브뤼셀로 건너가 탈북인 로기완의 행적을 좇는 것이 소설의 얼개를 이룬다. 소설은 2010년 12월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배경으로 삼는데, 그로부터 3년 전인 2007년 12월 브뤼셀에 도착했던 로기완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그는 로기완이 머물렀던 장소에 머무르고 그가 먹었던 음식을 먹는 등 로기완의 경험과 느낌을 가능한 한 있었던 그대로 추체험하고자 한다.
2006년 1월 <한겨레21>에 실렸던 브뤼셀발 기사에 자극받은 작가는 직접 현지로 건너가 소설의 살과 피가 될 구체성을 챙겼다. 그러나 이 소설은 유럽의 탈북인이라는 소재의 특이성에만 기대는 작품은 아니다. 작가는 탈북인의 아픔과 고초는 그것대로 직핍하게 그리면서도, 그들이 겪는 수난과 모색에 보편적 차원을 부여하고자 했다. 로기완의 행적을 좇는 화자 ‘김 작가’ 자신이 서울에 두고 온 고통, 그리고 로기완과 김 작가를 이어 주는 퇴직 의사 박윤철의 아픔이 로기완의 이야기와 포개지면서 소설은 한결 풍부하고 복합적인 울림을 준다.

김 작가 ‘나’의 고통은 무엇인가. 불우한 이웃들의 사연을 다큐로 만들어 방송함으로써 후원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 작가였던 그는 ‘혹부리’ 여고생 윤주의 이야기를 좀더 극적으로 방송에 내보내려다가 오히려 윤주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온다. 연인 관계였던 피디와도 사이가 틀어진다. 한편 박윤철은 말기 암에 시달리던 아내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안락사를 도왔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로기완의 죄의식에 공감하는 박윤철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니셜 엘은 (…) 내가 내 인생 속으로 더 깊이 발을 들여놓도록 인도하는 마법의 주문에 가까웠다.” 벨기에에서 가까스로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얻었던 로기완은 필리핀 출신 연인을 좇아 또다시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국으로 향하거니와, 로기완의 이런 용기는 거꾸로 김 작가와 박윤철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처를 맞대면하도록 부추긴다. 상처의 연대, 용기의 전염이다. 최재봉 기자, 사진 창비 제공
![<font color="#00b8b1">[현장]</font> ‘윤어게인’ ‘스톱 더 스틸’…국힘 대구 집회 한가운데 ‘극우 깃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1/53_17584326811567_20250921501197.webp)





![‘王’ 써줬다는 동네 할머니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514524964_20250921502061.webp)
![[사설]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 내란 연루 의혹 낱낱이 밝혀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72700526_20250921501922.webp)





![[단독] 채 상병 특검, 인권위에 ‘교체 전 김용원 컴퓨터’ 제출 요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9/53_17582787830043_2025091950270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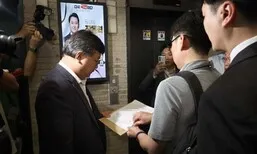




![부끄럽고 한스러워 죽고 싶어도, 살아날 길은 있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376387323_20250921501558.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 머지않았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