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씨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진보 논객’이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우승열패의 신화> 같은 책을 통해 한국 사회의 허위의식을 가차없이 통박해온 박노자씨의 본디 전공은 ‘한반도 고대사’다.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거꾸로 보는 고대사>는 박노자씨가 처음 펴내는 고대사 대중서다. ‘우리의 위대했던 고대사’ 담론에 열광한다거나 그 고대사에 일말의 자부심을 품고 있는 이들이라면 박노자씨의 논지가 도발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거꾸로 보는 고대사>는 국경으로 장벽을 친 땅덩이 안에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고대사’를 보는 시각에 오늘의 민족·국가의식을 투영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고대엔 지금 같은 국경도 없었으니 고대인들의 ‘집단’의식은 현대 한국인의 ‘국가’의식, ‘민족’의식과는 달라도 한참 달랐으리라는 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면 한국인의 내면 속에서 그 상식은 여지없이 길을 잃는다. 삼국통일을 이룬 수완가로 칭송됐던 김춘추를 비롯한 신라세력은 외세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패망하게 한 배신자쯤으로 지탄받는다. ‘위대한 고구려’, ‘고조선의 영광’,‘만주 고토 회복’ 같은 담론이 여기에 합세한다.
이 책은 묻는다. 신라는 민족의 배신자인가? 요컨대 당과 동맹을 맺어 고구려, 백제를 친 신라를 반민족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전근대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근대적인 시각이라고 박노자씨는 말한다. 신라 본위로 쓰인 <삼국사기>는 물론 <삼국유사>에서도, 조선 전기 <동국통감>과 조선 후기 <동사강목>도 통일(후기)신라를 ‘정통’으로 보았다.
<동사강목>은 수나라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의 승리를 ‘외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로 찬양하기보다는 “도덕성이 부족한 단명의 수나라에 본때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하며,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승리는 “도덕적 우월성에 의한 천명(天命)”으로 이해했다. 요컨대 전통시대 사학에서는 신라와 수·당의 동맹관계를 반민족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국제연대로 인식했다고 박노자씨는 적는다.
이런 인식은 언제, 왜 바뀌었나? 남북한 분단 이후 이질적인 해석으로 나아간 남북한의 고대사 시각은 1990~2000년대 들어 오히려 비슷해졌다.
분단 초기에는, 북한 사학이 한반도 북반부 국가로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신라통일을 부정했다면, 남한은 “영남의 정치·경제적 역량을 고려해 신라 계승을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북한은 1991년판 <조선통사>에서 “영토야욕을 채우려고 외래 침략세력을 끌어들인 신라 봉건 통치배”들을 질타하고 “고구려 유민이 세운 강성대국 발해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물론 여기에는 남한이 미국이란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비난이 닿아 있다.
남한에선 1950년대 “일본 관학자들의 학통을 이은 이선근 같은 관학자들”이 ‘삼국통일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위업’을 찬양했다. 이런 통념은 좌파 민족주의가 힘을 얻었던 80년대에 비판을 받았다. 90년대 이후 남북국시대란 용어를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후기신라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남한에서도 통일신라론은 궁지에 몰렸다.
‘남북을 초월한 이런 합의’의 밑바닥에는 구한말과 식민지시대 민족사학이 놓여 있다고 책은 말한다. 민족사의 틀이 확립된 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시기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신채호를 위시한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수호 정신으로 고조선과 고구려·발해의 강성함과 만주 벌판 지배를 부각시키는 민족사 쓰기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수난의 현대사’가 ‘위대했던 고대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채호는 “다른 민족을 끌어들여 동족인 고구려·백제를 없앤 김춘추”를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했고, 손진태는 “민족적으로 최대의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두 거두의 시각은 물론 일제강점기 친일파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박노자씨 역시 “우리가 현재적 이상들을 소급 적용해 과거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책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삼국의 싸움을 동족상잔으로, 당나라와 손잡은 신라의 행동을 배신으로 보는 태도는 “오늘날 동질화된 한인(韓人)이라는 종족적 집단의 모습을 1500년 전 과거에 투영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한·중·일 간 ‘(민족주의적)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바, 이 역사전쟁의 극복은 어느 한쪽의 독선적 민족주의나 다른 쪽의 자아중심적 논리가 아니라, 근대적 민족주의를 더는 고대사에 투영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고대사에 등장하는 모든 한반도 정치체들을 뭉뚱그려 ‘우리 민족’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요컨대 고대 한반도는 종족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회였다는 것, 고구려는 옥저와 예, 말갈과 낙랑 출신 한인(漢人)들까지 받아들였으며, 통일신라는 백제, 고구려 유민과 일부 말갈을 통섭했으니, ‘서로 스며듦’, ‘각종 흐름’의 과정으로 고대사를 보자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다. 그가 제안하는 고대사 패러다임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원효는 ‘신라의 고승’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지역적 맥락’에서 활동하고 영향을 끼쳤던 ‘동아시아 사상가’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고대사에서 왜(일본)는 항상 ‘우리’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혜와 동맹의 관계도 맺었음을 사료들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사진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선출되지 않은 팬덤권력 김어준 [세상읽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25561924_20250923503778.webp)
![“안창호 위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75825476_20250923504069.webp)



![[속보]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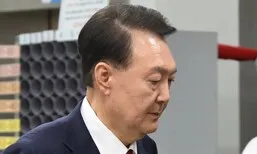




![[단독] “김용원 태도 변화 감지됨”…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메모 특검에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01270863_20250923503714.webp)

![[단독] 통일교 전국 교구장, ‘한학자 구속’ 첫 입장 표명…“지도부 사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82754446_20250923503905.webp)
![[단독]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5639958_20250923504035.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4대강 사업 뒤 생긴 녹조 74%가 낙동강서 발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3662263_2025092350403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