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고준〉
고종석 지음/새움·1만3800원
기자 출신 작가 고종석(51·사진)은 1993년 장편 <기자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 <제망매>와 <엘리아의 제야> 두 권의 단편집을 펴냈던 그가 17년 만에 두번째 장편 <독고준>을 내놓았다.
<독고준>은 선배 작가 최인훈의 장편 <회색인>과 <서유기>에 바치는 오마주와 같은 소설이다. 이 책의 제목은 최인훈의 두 소설 주인공 이름에서 왔다. <회색인>과 <서유기>가 소설가를 꿈꾸는 사변적인 대학생 독고준의 이야기를 그린다면, 고종석의 소설은 그 뒤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가로 일가를 이룬 장년의 독고준을 등장시킨다. 그러니까 <독고준>은 <회색인>과 <서유기>의 뒷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독고준>은 2009년 5월23일, 일흔네살 독고준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임 대통령의 자살보다 불과 몇 시간 앞선 그의 자살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소설은 그로부터 일년여 뒤, 독고준의 딸 원이 아버지가 쓴 일기를 읽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논평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한다. 독고준의 일기는 1960년 4월28일부터 2007년 12월19일까지 햇수로 48년에 걸쳐 있다. 작가는 독고준의 일기와 그에 대한 독고원의 논평을 날짜순으로 싣는 대신, ‘4월’에서부터 시작해 ‘3월’까지 월별로 재배치한다. 그러니까 연도에 상관없이 4월에 쓴 일기를 순서대로 앞세운 다음, 같은 방식으로 5월치 일기를 뒤따르게 하는 식이다.
최인훈의 두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 <독고준>에서 최인훈 소설의 주인공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재미난 놀이와도 같다. 최인훈 소설에서 연상의 화가 이유정과 기독교 소수 종파 신도 김순임 사이에서 갈등하던 독고준은 결국 김순임과 결혼한 것으로 나온다. 대학생 독고준을 동료로서 끌어들이려 했던 정치 동아리 ‘닫힌 세대’의 친구 김학은 오래도록 준과 교분을 유지하며 문민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함께 원산의 중학생 시절 방공호에서 경험한 낯선 여자의 부드러운 팔과 뭉클한 감촉, 누이를 버리고 월남해 새롭게 가정을 이룬 매부 현호성, 먼 친척들을 찾아 안양 부근 시골을 찾아갔다가 허탕친 이야기 등의 세목이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독고준>의 집필 의도가 최인훈 소설의 단순한 되풀이에 있지는 않다. 고종석의 소설은 최인훈 소설에서 대학생에 머물렀던 독고준의 장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그 점에서 <독고준>의 작가는 자유로이 상상력을 발휘했겠지만, 그 상상력은 <회색인>과 <서유기>의 작가가 그어 놓은 금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는 없는 상상력이다. 고종석은 최인훈이 그렸던 청년 독고준이 좀더 나이를 먹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되었으리라는 예상과 기대에 가능한 한 충실하게 장년의 독고준을 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계인이자 단독자” “좌파 개인주의자” “비관주의자” “얼음처럼 차가운 회의주의” “수정처럼 투명한 문체”
이것은 독고준의 딸 원이 제 아버지의 사람됨과 문학을 두고 쓴 몇몇 표현들이다. “회색의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서 몽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자는 몸가짐”을 표방했던 <회색인>의 주인공에 어울리는 특성들이라 하겠다. 4월혁명이 이승만의 축출로 귀결된 뒤 “나는 혁명의 방관자였다”는 반성으로 시작된 일기를 통해 부각되는 독고준의 캐릭터에는 또한 최인훈과 고종석 두 작가의 면모 역시 진하게 투영되어 있다. 가령 “소위 ‘참여문학파’와 ‘순수문학파’ 양쪽으로부터 ‘회색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서술은 작가 최인훈의 문단 내 위치에 부합하는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 문제나 수구 언론 문제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의제들에 대해 작가들이 드러내는 무관심은 놀라울 정도”라는 독고준의 일기 한 대목은 고종석의 평소 지론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독고준>은 뚜렷한 줄거리나 이렇다 할 사건, 또는 인물의 변화와 발전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발췌된 일기와 그에 대한 논평이라는 형식적 특성 탓에 소설은 불연속적·파편적이며 사변적인 색채를 짙게 드러낸다. 사건과 행동이 아니라 관찰과 판단이 소설을 끌어 가는 원리가 된다. 그럼에도 고종석의 유려하고 섬세한 산문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각별한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법하다.
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사진 고종석 제공

![선출되지 않은 팬덤권력 김어준 [세상읽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25561924_20250923503778.webp)
![“안창호 위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75825476_20250923504069.webp)



![[속보]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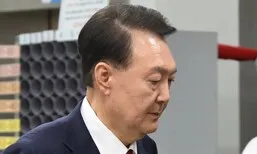




![[단독] “김용원 태도 변화 감지됨”…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메모 특검에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01270863_20250923503714.webp)

![[단독] 통일교 전국 교구장, ‘한학자 구속’ 첫 입장 표명…“지도부 사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82754446_20250923503905.webp)
![[단독]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5639958_20250923504035.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4대강 사업 뒤 생긴 녹조 74%가 낙동강서 발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3662263_2025092350403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