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봉의 문학풍경 /
문학작품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것은 물론 창작자의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상력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이 사회적 맥락과 맞부딪쳐 피워 올린 불꽃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적 맥락을 다른 말로 콘텍스트 또는 매트릭스라 하겠다.
여기에다가 동서고금의 문학작품들이라는 또 하나의 범주를 추가해 보면 어떨까. 문학작품은 작가의 상상력과 사회적 맥락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작품들의 모방과 극복을 통해서도 태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바꿔 말하자면, 하나의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대화적 관계에 놓인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기성의 작품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문학작품에 대해 또 하나의 환경, 즉 매트릭스로서 구실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선행 작품을 크게 의식하고서 씌어지는 가장 흔한 사례는 패러디일 것이다. 패러디는 기존 작품을 의도적으로 흉내내거나 비틀어서 새로운 효과를 내는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꼭 패러디가 아니더라도 복수의 작품 사이에 모방 내지는 습합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문학사에 대한 의식이 민감한 작가일수록 선행 작품을 대화 상대로 삼아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일이 잦다.
대표적인 작가로 최인훈과 고종석을 들 수 있겠다. 최인훈은 박태원의 단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을 이어받아 1960,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연작 장편을 쓴 바 있다. 만년의 대작인 <화두>에서는 조명희의 소설 <낙동강>(1927)이 작품을 끌어 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최인훈은 이밖에도 <금오신화> <열하일기> <옹고집전>처럼 고전의 제목을 빌려와 현대의 이야기를 하거나, <춘향뎐> <놀부뎐>처럼 고전을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쓴 단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고전 패러디는 소설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어서 낙랑 설화를 재해석한 <둥둥 낙랑둥>, 온달 이야기를 변형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심청 이야기를 다시 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같은 희곡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기자 출신 작가 고종석은 많은 소설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초기 단편들에서 고전 패러디에 큰 의욕을 보였다. 첫 소설집 <제망매>(1997)에는 표제작과 <찬 기 파랑> <서유기> 등 신라 향가와 중국 고전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쓴 작품 셋이 포함되었다. 표제작은 월명사가 지은 향가와 마찬가지로 죽은 누이동생을 추모하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두 작품은 같은 제목의 원작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원작의 제목이 주는 아우라는 고종석의 새로운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게 마련이다.
그 고종석이 이번에는 다름 아닌 선배 작가 최인훈의 소설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가 지난달 12일부터 인터넷서점 인터파크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 ‘독고준’은 최인훈의 두 장편 <회색인>과 <서유기>의 주인공 독고준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최인훈의 두 소설에서 독고준은 아직 대학생 신분이지만, 고종석의 ‘독고준’은 그 뒤 소설가로 일가를 이룬 뒤 일흔네 살 나이로 자살하기까지 장년기의 독고준을 그 딸의 시선으로 다룬다. 독자로서는 최인훈의 두 소설과 고종석의 신작을 비교해 가며 읽어 보면 특별한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법하다.

![선출되지 않은 팬덤권력 김어준 [세상읽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25561924_20250923503778.webp)
![“안창호 위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75825476_20250923504069.webp)



![[속보]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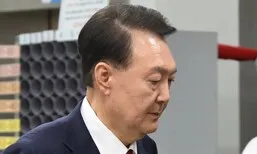




![[단독] “김용원 태도 변화 감지됨”…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메모 특검에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01270863_20250923503714.webp)

![[단독] 통일교 전국 교구장, ‘한학자 구속’ 첫 입장 표명…“지도부 사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82754446_20250923503905.webp)
![[단독]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거부 “주말께 구치소서 조사받겠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1/53_17584438164098_5117568038778844.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5639958_20250923504035.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한학자 “통일교 지지하는 의인 찾아 투표하라” 독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3/53_17586241581475_20250923503840.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4대강 사업 뒤 생긴 녹조 74%가 낙동강서 발생](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4/53_17586663662263_2025092350403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