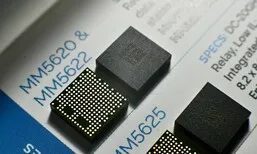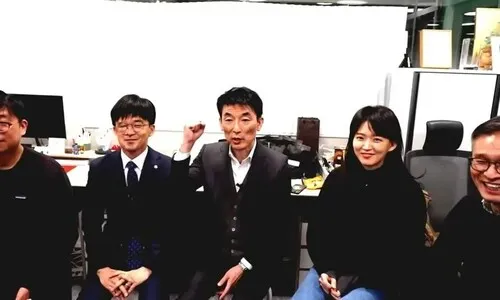“정권이 교체되면 내년에 증시(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되면 (내) 임기 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
2007년 12월14일,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여의도 한 증권사 객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주가가 낮은 것은 노무현 정부 탓이라고 했다. 선거에서 이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2008년 2월25일∼2013년 2월24일) 기간 코스피지수는 1709.13에서 시작해 2018.89로 끝났다. 주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한때 892.16(2008년 10월27일)까지 폭락했다. 임기 중 최고치는 2231.47(2011년 4월27일)이었다. 3000에는 근접도 못 했다.

2012년 12월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5년 내 코스피지수 3000 시대를 꼭 열겠다”며 “지켜봐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지수는 2009.52에서 시작해 2097.35로 끝났다.
못 지킬 약속 “주가 끌어올리겠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인들의 거창한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애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럴 정책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법인세 감면액만큼 주주 이익이 늘어나게 됐지만, 상장사 실적이 크게 나빠지자 별 의미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나 재임 중 주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코스피지수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1439.43(2020년 3월19일)까지 떨어졌다가 반도체 특수와 저금리에 힘입어 3316.08(2021년 6월25일)까지 올랐다. 엄청난 널뛰기를 하는 가운데, 추세는 상승이었다. 취임일인 2017년 5월10일 2270.12였던 지수가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2610.81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코스피지수는 2200∼2600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1월31일 종가는 2497.09이다.
주식투자는 언제 사고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장기 투자수익률은 채권투자에 비해 높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만약 어떤 투자자가 2014년 1월29일 종잣돈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을 골고루 샀다면, 현재 수익률이 얼마인지 살펴보자. 코스피지수는 1941.15에서 2497.09로 올랐다. 세금 부담과 배당수익을 제외하고 보면, 10년간 수익률이 28.6%다. 연평균 수익률은 2.55%에 그친다. 결코 ‘고위험 고수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익률이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55% 오르고 연평균 수익률이 4.5%로 조금 나았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144% 올라, 연평균 수익률이 9.3%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0년간 136% 올라, 연평균 수익률이 9.0%다.
미국·일본 증시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간 코스피지수나 다우지수, 닛케이지수를 움직인 핵심 변수는 모두 상장사 실적이었다. 주가가 기업 이익의 몇배로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주가수익비율(PER)의 추이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지수의 평균 주가수익비율(예상이익 기준)은 지난 10년간 10∼20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평균값 15.5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거의 평평하다. 주가가 상장사 실적에 수렴해왔다는 뜻이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뉴스레터’를 쳐보세요.
☞한겨레신문 정기구독. 검색창에 ‘한겨레 하니누리’를 쳐보세요.
코로나 때 개인투자자 42%가 손실
일본 닛케이225지수의 주가수익비율(예상이익 기준, 가중평균PER) 추이도 마찬가지다. 최근 10년간 15를 평균으로 추세선이 거의 수평이다. 주가 상승은 실적 향상에 따른 것이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일본은행이 무제한 돈을 풀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뒤 일본의 상장사들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을 누렸다.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그 이면에서 일본의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이 2013년(지수 105.1) 이후 2022년(99.7)까지 9년 새 5.1%나 감소했다. 2023년에도 11월 시점에 전년보다 3.0%나 추가 감소했다.
미국 다우지수는 구성 종목이 30개에 불과해, 평균의 착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신 에스앤피(S&P)500지수 구성 종목의 최근 10년간(2014년 1월∼2023년 9월) 주가수익비율 추이를 보면, 평균값은 23.5이고 추세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한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 차이는 상장사들의 성장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일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볼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조한 배당 등 주주 환원의 미흡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한국 증시의 낮은 수익률이 상장사 실적 부진에서 비롯함을 바로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월 결산 상장사 영업이익은 58.7조∼70조원 사이에서 옆걸음질했다. 코스피지수가 1800∼2100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시기다. 그 뒤 2017년 98.9조원, 2018년 105.3조원으로 급증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전 덕이었다. 이때 코스피지수는 2200∼2500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019년 53.9조원, 2020년 64.3조원으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105조원으로 급증하고 코로나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까지 겹쳐 주가지수 3000 시대가 잠시 열렸다. 하지만 2022년 70.3조원으로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버렸다. 주요 상장사들이 포진한 산업에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상장사들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은 저조한 수익률에 지쳐버린 많은 개인투자자를 간접(펀드)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돌아서게 했다. 그렇다고 투자 성과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폭증한 코로나 국면에서 4개 증권사 20만4004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투자행태와 투자성과’란 보고서를 2021년 6월 낸 바 있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분석 대상 개인투자자들은 중소형주와 특정 섹터에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했고, 거래도 잦았다. 거래 비용을 차감한 뒤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보니,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2%포인트 낮았다. 새로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17.6%포인트나 밑돌았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국면이었지만, 전체 개인투자자의 42%가 투자 손실을 봤다.
주가 상승이 미진한 가운데, 소수 개인투자자만 돈을 벌고, 다수는 손실을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낮은 수익률에 지친 투자자들은 더욱 위험한 투자로 나서고 있다. 급등 기대를 갖고 테마주 거래에 몰려들면서, 별 근거 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한겨레 경제부장·도쿄특파원을 역임했다.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등의 책을 썼다. 라디오와 티브이에서 오래 경제 해설을 해왔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이 대통령 지지율 60% …“외교 잘해” 가장 많아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21/53_17636896588708_2025112150101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