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까지 51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온 전셋값을 바라보며, 김아무개(25·여)씨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올해 취업에 성공한 그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다. 알뜰살뜰 월급 모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찼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었다.
꿈은 깨졌다. 직장이 있는 서울 방배동에서 새 전셋집을 구하면서다. 33㎡(약 10평) 원룸 전셋값이 1억5000만원을 넘었다. 감당이 안됐다. 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했다.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대전에 사는 부모님은 아파트를 담보로 전셋값을 마련해줬다.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하고도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서글퍼요.” 김씨는 “언제 자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시름이 더욱 깊어간다.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인 이들은 예전보다 나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거나 부모세대에게 또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전셋값 폭등은 자기 집이 없는 청년층에게 ‘공포’ 그 자체다. 통계청 집계로 자기집을 가진 20~34살 청년층은 8.6%다. 91.4%가 전세 대출금을 갚거나 월세를 내느라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얘기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해도 집세의 공포는 해결되지 않는다.

직장인 박아무개(33)씨는 최근 가까스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집을 구했다. 지난해 1억원이던 원룸 전셋값이 3000만~4000만원가량 올라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나마 전셋집은 구하기도 어려워 겨우 반전세로 들어갔다. 박씨는 “앞으로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들어갈 전세대출금 상환액과 반전세 이자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집값에 생활비까지 따로 쓰면 한동안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더 열악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고시원 등 주거 취약지대로 내몰리기도 한다. 취업준비생 박아무개(30)씨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셋값은 물론 월세도 감당이 안 돼 지난달부터 한 달에 25만원 정도 내는 고시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전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경제력은 떨어지고 법률지식·경험은 부족한 청년층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마저 생긴다. 집에 이상이 생겨 보수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해 불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집 주인도 있다.
청년층의 극심한 주거 불안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비 부담에 청년층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모세대의 노후 자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비용까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대표는 “주거 문제를 사회권으로 인정하고 저소득 1인가구 지원 정책이나 다양한 공동주택 모델 개발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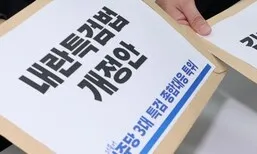

![[단독] 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 적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6/53_17624145431193_20251106502950.webp)
![[뉴스 다이브] 김건희 ‘판도라 폰’ 남자 체포 직전 도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1106/20251106502582.webp)














![[속보]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7명 매몰, 구조 중”](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6/53_17624084094998_20251106502352.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 적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106/53_17624145431193_20251106502950.webp)
![<font color="#00b8b1">[현장] </font>장동혁, 5·18 참배 5초 만에 쫓겨나…시민들 “내란 국힘이 어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106/53_17624085760578_2025110650236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