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의 신상에 대해서 쓰라면 나는 다만 한 줄도 쓸 게 없다.
천사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땅에서 발을 뗀 지 140일째(5월 25일 현재)
난 등대의 외로움을 이해한다.
육지에서 두 발 딛고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싶을 등대의 욕망도 이해한다.
고공크레인 위에서 트위터가 없었다면 난 언어를 잃었을 것이다.
인간이 습득한 문명이란 게 얼마나 허약한지를 징역독방에서 난 이미 체득한 경험이 있다.
이 폐절된 공간에서 퇴화를 지연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트위터였다.
손바닥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나는 세상을 향해 맹렬히 구조 신호를 보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난파선의 필사적인 깃발을 용케 알아본 사람. 김여진.
“어, 내가 보고 싶은 분, 거기 괜찮은가요?”
내가 기억하는 첫 접선, 그렇게 우리는 조우했다.
그녀는 육지에서 나는 바다에서.
그녀가 배우였음을 알고, 연속극도 안 보고 살았던 삶이 꼭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회의했다.
단 한 번도 마주앉아 얘기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아프고 질긴 공감.
희망에 대한 유대감.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파업농성장엘 왔다. 배우에겐 몹시 무모한 일이다.
그 무렵 공장은 음산했다.
파업은 석달을 넘어가는데 교섭은 봉쇄되고, 사측의 고소고발, 징계, 손배·가압류로 질식해가던 조합원들이 숨쉬고 살겠다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공장엔 남은 자들의 탄식으로 크레인에 녹이 슬고 있었다.
남겨진 자에게도 떠나는 자에게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들.
가스 불 끄는 걸 잊은 냄비 속의 고등어조림마냥 온몸의 핏줄들이 자작자작 타들어가던 초조함.
이런 공장에 웃으면서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더군다나 이 85크레인은 죽음이 전제된 공간이다.
그러나 과연 날라리들이었다.
노란 개나리들처럼 몰려와서는 수학여행 온 아이들 마냥 웃고 떠들고 사인해주고, 사진 찍고, 공장 안에서 거친 사내들이 성긴 손으로 차려내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갔다.
그뿐이었다. 집회도 없었고 발언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날 모처럼 조합원들에게서 물 오른 버들강아지 같은 생기가 돌았다.
우리도 웃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울려 웃고 나니 가장 큰 고비를 넘어서 있었다.
그녀가 홍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던 일보다, 더 내 마음을 울렸던 건 그녀와 함께 인도에 봉사활동을 갔던 젊은이가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이었다.
불가촉천민.
그 남루하고 허물어지고 가난의 주름이 파도치는 노파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을 감고 울먹이던 사람. 아!
내가 인도여행에서 하루에 천명도 넘게 봤던 사람들.
1루피를 구걸하며 날파리처럼 엉겨붙던 그들에게 동전을 에프킬라 뿌리듯 던져주며 파리를 떨쳐냈던 위선의 기억이 나는 오래도록 괴로웠다.
그녀가 저토록 빛나는 건 사심 없는 진정성의 힘이다.
자신의 영혼을 너른 들판에 풀어놓곤, 질주를 하든 자갈밭을 디디든 붙잡지도 돌려세우지도 않는 사람.
그 봄바람 같은 자유의지에 많은 이들이 공명하는 건, 다들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들판으로 나가기 위해선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2003년 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맨 김주익의 129일을 넘어, 이 시간까지 나를 지탱해온 건 천사들이었다.
트위터에서 나를 응원하던 수많은 사람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온 마음 다해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박혜경, 정혜신.
그리고 끼니마다 밥을 만들어 올려주는 사수대의 저 간절한 눈빛.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목이 메이는 천금 같은 우리 조합원들.
139일 동안 나는 쇠파이프를 손에 거머쥐고 잤다.
공권력이 투입될 때 유리창을 깨기 위한 용도다.
쇠파이프를 거머쥐고 꾸는 꿈이 꽃꿈일 리는 없다.
꽃을 든 그녀의 손과 쇠파이프를 든 내 손이 언제 만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앉아 그녀의 우크렐레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꿈을 포기 하진 않을 생각이다.
나의 천사들이… 참 많이 보고 싶다.
2011. 5. 25
크레인농성 140일이 밝아오는 새벽
한진중공업 김진숙 올림
추신: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과 김은숙씨의 사망,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 하루 늦었습니다. 4일을 매달려 쓴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 ‘내가 만난 천사’ 페이지 가기
바다를 찾아온 육지의 사람
[천사 공모 네티즌 투표 후보작⑩]
고공농성 140일째, 한진중공업 김진숙 위원이 4일을 매달려 쓴 글
필사적인 깃발을 알아보고 안부를 물어온 김여진 등 나의 천사들…
- 수정 2011-05-25 17:22
- 등록 2011-05-25 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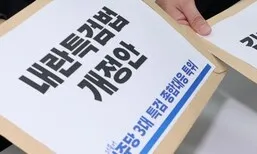

![[단독] 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 적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6/53_17624145431193_20251106502950.webp)
![[뉴스 다이브] 김건희 ‘판도라 폰’ 남자 체포 직전 도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1106/20251106502582.webp)














![[속보]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7명 매몰, 구조 중”](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06/53_17624084094998_20251106502352.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 적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106/53_17624145431193_20251106502950.webp)
![<font color="#00b8b1">[현장] </font>장동혁, 5·18 참배 5초 만에 쫓겨나…시민들 “내란 국힘이 어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106/53_17624085760578_2025110650236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