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번주 국어 시간에 발표 과제 있는데 겁나요.”
열다섯살 수영이(가명)는 사회성이 좋아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발표 불안을 호소했다. “발표할 차례가 되면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요. 외웠던 게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서 횡설수설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정말 그 시간이 끔찍해요.”
수영이처럼 수행평가 발표 과제를 앞두고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이 있다. 발표 불안은 특히 자의식이 강해지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영이는 평소 ‘말발 좋은’ 자신이 발표할 때 친구들 앞에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못나게 느껴진다고 했다.
수영이뿐 아니라 발표 불안을 나타내는 아이들에게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 ‘이렇게 떨다간 완전 망할 거야. 이런 내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겠지. 나 빼고 다들 잘할 거야…’ 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만 떨리는 게 아냐.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하고 떨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등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도 도움이 된다. 불안으로 인해 신체에 나타나는 긴장 반응을 완화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실수도 줄일 수 있으므로 발표하기 전에 미리 몇번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어느 정도의 발표 불안은 해소된다. 한데 심한 경우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발표 불안이나 시험 불안 등 소위 ‘수행 불안’이 심한 아이들을 보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런 성향은 대부분 양육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마다 야단을 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게 된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나머지 오히려 일을 더 망치기도 한다.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책이나 자기 비난이 심해지면서 증상이 더 악화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 좀 하면 어때?”라고 말하지만, 그때의 실패나 실수는 성공이나 완벽을 위한 시행착오를 의미할 때가 많다. 성공이나 완벽함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실수나 실패의 부담감은 여전히 무겁다.
실수나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실수나 실패를 통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수나 실패를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늘 마주하는 양육자, 가족들부터 “실수나 실패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단다”라고 말해주자.
이정희 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사


![<font color="#FF4000">[단독]</font> 수심 43m 바닷속…‘조선인 136명 수몰’ 일본 해저탄광 문 열린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0/53_17548085429051_2025081050146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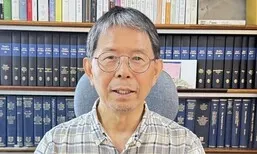
![[단독] ‘윤석열 선물세트’ 뿌렸다…구속 직전 우파단체에 핸드크림·시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227132932_20250810501965.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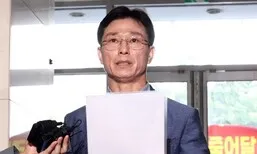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브로커였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052540164_6417544438189611.webp)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050080529_2025080850008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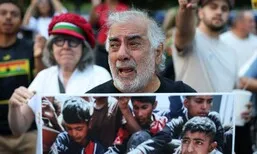




![<font color="#FF4000">[단독]</font> ‘윤석열 선물세트’ 뿌렸다…구속 직전 우파단체에 핸드크림·시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0/53_17548227132932_2025081050196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