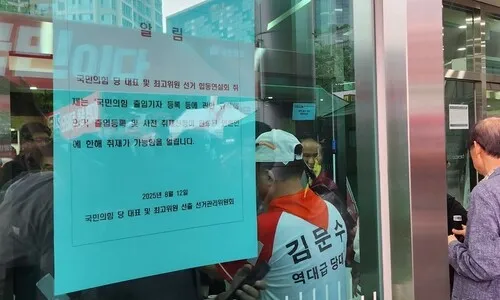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무기력한 이유는 날로 거칠어지는 학생 탓도 있지만, 단순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교원 임용고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초·중등 임용고사는 △교육학 지식을 묻는 객관식 시험(1차) △전공 분야에 대한 서술형 평가(2차) △수업실연(3차)으로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1차 시험이 임용고사 대비 사교육 팽창의 주범이라며 올해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초등 임용고사의 경우 2차 서술형 시험조차 단답식으로 출제돼, 수험생들 사이에 ‘족집게’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신웅식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연대국장(경인교대)은 “각 교대 교수들이 임용고사 대비 모의고사를 출제하는데, 실제 시험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 수험생들이 서로 사고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용고사의 마지막 단계에 수업실연과 적성면접이 포함돼 있지만, 교사들은 이에 대해 ‘연기로 때울 수 있는 쇼’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교직 2년차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0분 동안 시나리오를 짜서 부진아 지도를 하는 척하고, 있지도 않는 학생과 눈 마주치는 척하며 웃기까지 한다”며 “다양한 부적응·정서 불안 학생을 만나는 실제 교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라고 말했다.
사범대나 교대 재학 중에 생활지도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사범대에서 생활지도와 관련해선 2학점짜리 단 한 과목을 수강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발령받고 학교의 선배 교사들한테 배운 게 전부”라고 말했다. 특히 과목별로 양성하는 중등의 경우, 교사들의 교육자적 자질보다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전공 과목과 관련한 지식만 강조하고 있다.
유형근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생활지도 관련 과목은 필수가 아니라서 극단적인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은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학생과 관계를 맺는 생활지도가 교과지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족집게’ 시험문제 사서 달달
3차 수업실연은 ‘연기 오디션’
임용고사 ‘책임론’ 지적
- 수정 2012-03-25 21:16
- 등록 2012-03-25 21:16
![<font color="#FF4000">[단독] </font>경호처 ‘파묘’…오방신 무속 논란 ‘윤 대통령실 5개 기둥’ 철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2/53_17549825460508_8217549825195017.webp)







![[단독] 박성재, 계엄 직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윤석열 하명 받들었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1/53_17548949099818_20250804501213.webp)








![[속보] ‘김건희 집사’ 인천공항서 체포…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2/53_17549947949581_7517549947612149.webp)






![[사설]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위험의 외주화’도 끊어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2/53_17549946721669_20250812503671.webp)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050080529_20250808500084.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김건희 집사’ 인천공항서 체포…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812/53_17549947949581_751754994761214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