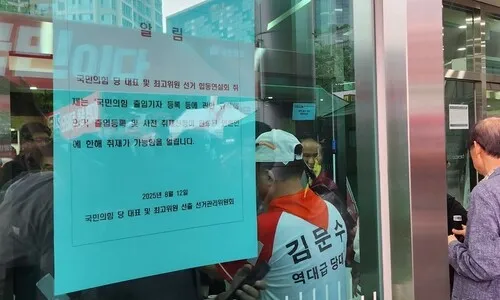문필서예가 림성만(52) 작가는 한겨레를 몰랐었다. 1988년 오랜 친구가 “바르고 곧은 신문이 필요하다”며 50만원을 내고 한겨레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 돈이면…”이라면서 혀를 찼다. 그러던 림씨가 변했다. 올해 한겨레가 제2창간운동을 시작하자, <나눔> 등 자식 같은 작품 2점을 기증했다. 5년 동안 한겨레를 구독하면서 생긴 변화다.
“발전기금을 내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가진 재주는 이것밖에 없어서…. 사실 보내면서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좋은 일에 보태라고 제 작품을 내놓은 적도 처음이고 해서….”
충남 태안에서 활동중인 그의 작품은 ‘한겨레 제2창간 소식’을 통해 소개됐고 이를 본 한겨레 독자 2명이 구입했다. 림씨는 구입 액수만큼 주식을 가진 주주가 됐다. 그러자 <여울> 등 2점을 또 보냈다. 이번에는 주식으로 주지 말고,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가 왜 좋은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를 물었다. 왜 좋은지는 한겨레 독자라면 다 알 테니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신문을 좀더 잘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까지 ‘18.0(도)’섹션에 연재됐던 ‘홍은택의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을 꼭 챙겨봤습니다. 몇 년 전 ‘유용주의 노동일기’도 좋았고요. 이번엔 어떤 얘기가 실렸을까 기다려지는 글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주 신문이라 독자의 의견에 좀더 귀기울이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왜냐면’을 포함해 의견란이 너무 많아 다른 신문에 비해 정보가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림 작가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한겨레와의 인연을 주변으로 넓혀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글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사진 최경자 작가 제공
![<font color="#FF4000">[단독] </font>경호처 ‘파묘’…오방신 무속 논란 ‘윤 대통령실 5개 기둥’ 철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2/53_17549825460508_8217549825195017.webp)







![[단독] 박성재, 계엄 직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윤석열 하명 받들었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1/53_17548949099818_20250804501213.webp)








![[속보] ‘김건희 집사’ 인천공항서 체포…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2/53_17549947949581_7517549947612149.webp)






![[사설]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위험의 외주화’도 끊어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2/53_17549946721669_20250812503671.webp)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050080529_20250808500084.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김건희 집사’ 인천공항서 체포…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812/53_17549947949581_7517549947612149.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