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법정기념일이 많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날’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매체마다 성공한 장애인들 이야기, 힘들지만 장애를 딛고 힘겹게 자립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평생 아픔을 함께해야 할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의 가슴 저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꼭 법정으로 지정해 준 날이 돼야 빚 갚듯 그러는 걸까? 장애인의 날이라면 당연히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근무하는 장애인시설에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울림 오르프 연주단’은 창단한 지 1년이 되었다. 1년 넘게 피나는 연습 끝에 5곡이나 소화하게 되었고 창단식 연주회를 정식으로 작년 11월에 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단원 중에는 악보를 읽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한곡 한곡 연주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초청연주로 한동안 바빴다. 가장 빛났던 연주는 일산 백병원에서 있었다. 감동이었다. 환우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작지만 희망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은 전적으로 돌봄의 대상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냥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러 대중음식점에 갔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대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인 듯 보이는 꼬마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할아버지! 저 사람 목소리와 말이 왜 그래요?” 한다. 아이 탓은 아니다. 나는 중증의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 1급이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 점들이 있어. 할아버지랑 너도 생김새, 목소리가 다르듯이 옆에 있는 누나도 다르단다.” 난처해진 할아버지 설명에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르침과 경험이 없다. 어디서도 쉽게 장애인을 접해보지 못한다. 쉬쉬하고 숨기는 것만이 능사다. 편향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규교육과정에 특정 과목을 만들어 법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날이 장애인이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의 날을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과 동일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과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임시이사회 날이자 재활의 날이 형식적으로 탈바꿈한 4월20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일을 찾아주고, 또한 행사 자체도 장애인들이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장향숙 전 의원의 말을 새겨들었으면 한다.
김시내 용인베데스다 사회복지사
[발언대] ‘장애인의 날’ 진짜 생일 찾기 / 김시내
- 수정 2010-04-18 19:17
- 등록 2010-04-18 19:17


![[단독] 권성동 ‘차명폰’ 나왔다…통일교 윤영호, 건진법사와 연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7/53_17562453330604_20250826504682.webp)













![[속보]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특검 출석…“저는 결백하고 당당”](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7/53_17562566243889_2317562566030196.webp)
![[단독] 권성동 ‘차명폰’ 나왔다…통일교 윤영호, 건진법사와 연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7/53_17562453330604_20250826504682.webp)




![국민 61%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있다”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7/53_17562592530361_3617562154655859.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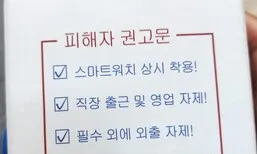
![[사설]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 제시한 정성호 법무장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6/53_17562012823814_20250826504276.webp)

![검찰 보완수사권의 역설 [유레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6/53_17561952181246_20250826504068.webp)

![국민 61%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있다”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7/53_17562592530361_3617562154655859.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