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나이의 어른이면 누구나 학창시절 방학의 추억이 꽤 서려 있을 것이다. 여름방학엔 냇가에서 가재 잡고 물장구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몰랐고, 겨울이면 빈 논에서 축구와 자치기를 하면서 놀다가 어머니의 부름이 있고서야 아쉬움을 달래곤 했다. 동네 뒷골목에서도 여학생들의 고무줄놀이로 노래가 그칠 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방학은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과 호흡하게 하고, 놀이를 통해 규칙과 어울림을 배워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뒷골목은 자동차에 점령당하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빼앗긴 채 놀이의 기쁨도 공부의 즐거움도 없이 오로지 경쟁 속에서 순결한 영혼들이 메말라 가고 있다. 학교로 학원으로 재촉하는 발걸음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스스로 공부할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있다.
논어의 ‘학이시습’(學而時習)에서 습(習)자는 날개(羽)를 스스로(白←自의 변형) 움직여 날 때까지 반복함으로 드디어 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학기 중 배움(學)이 있었으면 방학 중 스스로 익힐(習)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방학이라는 배를 타고 사색의 노를 저어 진리의 등대를 향해 항해하게 하라. 때론 비바람에, 높은 파고에 좌초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역풍을 이용하는 훌륭한 항해사가 될 수도 있지 아니한가?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창의적 개성은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할진대 진정한 교육개혁을 원하면 먼저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라. 방학 중 그들이 찾은 겨울산사는 영혼의 평화를 줄 것이고, 박물관은 역사적 자아에 대한 물음을 던질 것이다. 책에서 만난 위대한 스승들은 학교에서 맛보지 못한 인생의 진리를 설파할 것이고 학기 중 미뤄놓은 취미생활은 예술적 감성을 드높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스로 하는 학습은 ‘자치적 인생’의 기초가 될 것이다. 자치 없는 삶은 늘 강제될 뿐만 아니라 예속적이고 굴욕적이기까지 하다. 독학이 사라지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는 이 비윤리적 사교육 현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가? 자유 민주주의야말로 자치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치능력은 또한 자립적 삶을 이끄는 수레가 되기도 한다. 가히 오늘의 교육은 머리만 키우고 손발을 마비시키는 불구의 교육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 외에는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립능력은 거의 전무하다. ‘전문 바보’를 양산해 낸 셈이다. 그래서 취업은 낙타 바늘귀요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천하게 여기는 학벌위주, 자본중독 사회의 병폐요 산물이다. 오늘날 민중의 삶이 이처럼 피폐한 것도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민중의 경제자립 능력이 부재한 탓이다. 간디가 ‘농업’과 ‘수공업’을 교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바탕으로 한 이 비열한 자본과 권력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려면 학생들의 공동체적 자치 자립능력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방학은 물론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어른들이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학생들의 몫이자 그들이 누릴 천부적 권리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거룩한 시간을 절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는 공동범죄자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송남 전남 담양 한빛고 교감
[독자칼럼] 방학을 학생들 품으로 / 정송남
- 수정 2010-01-17 21:23
- 등록 2010-01-17 21:23


![[르포] 의성 산불 5개월…검게 탔던 숲, 스스로 살아나고 있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03/53_17568523042636_20250902504055.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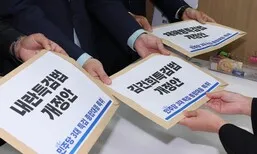




![[단독] 채 상병 특검, 공수처 검사 위증 넘어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01/53_17567258739106_20250901503722.webp)









![퇴근하지 못한 19살 청년의 꿈 [전국 프리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02/53_17568089645872_20250902503812.webp)






![임은정과 공봉숙의 하극상, 어떻게 다른가? [권태호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01/53_17567173890468_20250901503502.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김정은, 천안문 전승절 행사장 입장…검은색 정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5/0903/53_17568595117412_2025090350064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