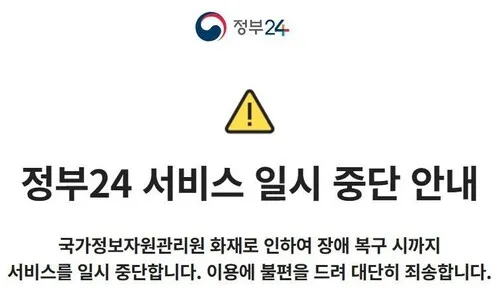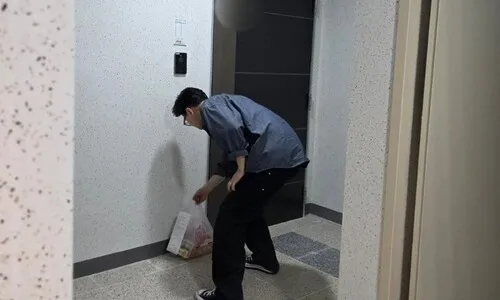장관에 해당되는 영어인 ‘미니스터’는 ‘마스터’에 대칭되는 말이라고 한다. 주인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왕의 일꾼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의 일꾼이 미니스터인 셈이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명칭에서 일꾼의 의미를 떠올리기란 어렵다. 일본의 대신이라는 말에 견주면 낫지만 용어에서부터 다소 권위주의적 냄새가 풍긴다.
소설가 출신으로 일본의 문화청 장관을 지낸 미우라 슈몬은 재임 기간 내내 장관 의자에 앉지 않고 소파에서 사무를 본 것으로 유명하다. 앉으면 머리 위까지 치솟는 우람한 의자가 마치 ‘전기의자’ 같아 싫었다고 그는 ‘장관실의 500일’에서 썼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높은 의자에 앉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한번 장관 자리에 오르면 가문의 영광이고, 죽을 때까지 장관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닌다.
대통령은 장관을 어떤 기준에서 임명하는가.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장관에 임명된 381명 가운데 ‘정치적 기준’이 고려된 경우가 236명으로 67%에 이른다. 정치적 고려라고 해도 요즘 화제가 되는 ‘차세대 지도자 육성용’ 등의 구체적 내용까지 수치로 잡히지는 않는다. 다만 장관을 거쳐 훗날 대선주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은 없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장관 재직 시절 평가를 보면 성공과 실패가 거의 반반이라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11개 부처 장관의 성적표를 김호균 전남대 교수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선주자 중에는 성공한 장관도 있지만 오히려 실패한 장관으로 꼽힌 경우도 있다. 아쉽게도 조사 대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지낸 해양수산부는 빠져 있다. 최근 장관직을 마치고 당으로 복귀한 열린우리당의 대선주자들이나, 이제 지도자 수업에 들어갈 예비 장관들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우리 시대의 장관
유레카
김종구기자
- 수정 2006-01-10 18:12
- 등록 2006-01-10 18:12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font color="#00b8b1"> [포토] </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6/53_17588514706415_20250926501092.webp)
![‘싱크홀 사고’ 80대 유족에게 치사 혐의…대체 왜? [뉴스A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5/0926/20250926500451.webp)












![[단독] 박진 전 장관 “이종섭 임명, 윤 대통령 뜻이라 거부 못 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5/53_17587942517055_20250925503898.webp)


![[단독] 양평군, 김건희 오빠 ‘휴경 농지’ 알고도 2년째 방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6/53_17588648758918_20250926502227.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6/53_17588916889001_20250926503132.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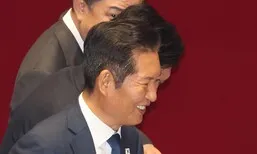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font color="#00b8b1"> [논썰]</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7/53_17589313160298_20250926503280.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