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숙
구술생애사 <할배의 탄생> 저자
비단 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5월8일치 <한겨레>에 실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칼럼은 “가족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단위”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그런데 그런가? 아직도 그런가? 가족이 개인들에게 정서적 바탕이거나, 가정경제와 생애와 죽음 이후까지 공동체 관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개별화, 특히 가족 관련 현상과 가치관이 급변한 21세기에도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기본 단위를 여전히 가족으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여성’을 ‘가족’에 붙인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의 퇴행 등 가족정책과 관련한 시민과 국가의 어긋남은 여전히 이런 관점에서 비롯한다. 이는 아직도 혈연과 가족 이데올로기에 더 매달려보겠다는 퇴행이며, 시민의 출생부터 죽음 이후까지 비용과 부담을 여전히 가족에게 우선 넘기겠다는 책임회피다.
가족을 인류 발생부터 시작되고 영원히 지속될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여기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가족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을뿐더러 이미 막바지다.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으로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는 임금노동자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재생산(휴식)과 노동자의 재생산(출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지금 가족의 모습이 급변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공익광고로 대표되는 국가의 경제개발 논리였다.
1961년 ‘혁명’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그의 집권 내내 국정과제 중심에 있었다. 그의 죽음 이후 1986년까지도 5차를 거듭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였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여섯 번 가까이 넘은 2018년 가족정책 역시 국가경제 논리라는 면에서 시대착오적이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일해서 번 임금으로 세금 낼 사람을 만들어달라’는 거다. 박정희의 ‘낳지 마라’가 성공을 거둔 데 반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낳아라’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 60년 사이에 국가만 빼놓고 세상도 시민도 변한 거다. 국가경제라는 게 내 살림살이와는 완전 딴판이며, 더구나 행복한 가정이니 사람의 도리니 하는 타령에 이용만 당하는 판이라는 걸, 서민들이 알아버린 거다. 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판에 내 돈과 돌봄노동을 들여 납세자이자 근로자로 차출될 노예를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다.
물론 사는 형편에 따라 가족 또한 양극화되어 있다. 자식의 성공에 온갖 지원을 할 여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물려주고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가족은 유지하고 확장해야 할 단위이다. 이들은 속은 어떻든 겉으로는 친밀감이 오고 가는 운명 공동체이자, 장차는 유전공학까지 구매하며 더 건강하고 유능하고 행복한 가족을 기획할 것이다. 한편 ‘다른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은 갈수록 걱정거리 운명 공동체다. 이는 계급에 따른 출산율의 양극화로 드러난다. 2015년 소득 상위 20%의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인 데 반해, 하위 20%에서는 0.7명이었다.
서민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정책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 아닌 시민이어야 한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형편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국가와 여성가족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야 할 발상의 전환은, 국가정책에서 가족 항목을 해체하고 가족에게 떠넘겼던 부담을 가져가는 것이다. 솔직히 돈 걷을 데는 많지 않은가.


![<font color="#FF4000">[단독]</font> 통일교 2인자, 권성동 통해 윤석열 독대…수첩엔 “대박, 역사적인 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723/53_17532407262079_251753239796473.webp)
![이 대통령 지지율 57%…‘8·15 사면’ 부정평가 54%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448222099_20250821500919.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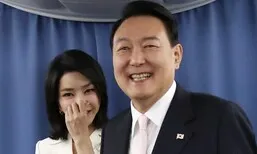
![[사설] 내란 특검, ‘대국민 사기극’ 벌인 한덕수 철저 수사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0/53_17556824730134_20250820503637.webp)




![[속보] 채 상병 특검,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수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426258027_20250821501464.webp)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압수수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376564088_20250821500821.webp)




![[단독] 트럼프에 209조 기업 투자 보따리 푼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0/53_17556860329806_20250820503752.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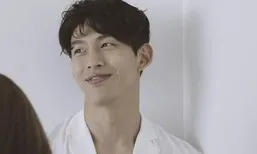

![한정애 민주 정책위의장 “당정대, 이견 없이 검찰개혁 추진할 것” [영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370224383_20250821500730.webp)
![당정대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 [영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0/53_17556966286765_20250820503964.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채 상병 특검,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수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1/53_17557426258027_20250821501464.webp)
![이 대통령 지지율 57%…‘8·15 사면’ 부정평가 54%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1/53_17557448222099_20250821500919.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1/53_17557400962282_6217557396817596.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