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
한겨레21부 디지털팀
“형, 협동조합처럼 박스나 하나 같이 할래요?” 전복적이었다. 운동이 지겨워지면 아예 ‘운동장’을 차리면 되는 거였다. 사실 그땐 크로스핏이 슬슬 지겨워질 때였다. 그때가 크로스핏 3년차인가, 4년차인가. 더 이상 하루 운동을 했다고 뼈와 살이 불타오르지 않았다. 처음엔 안 그랬다. 매일 탈진이었다. 더는 한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무호흡적 감각 속에서 박스(크로스핏 체육관) 바닥에 쓰러져 있노라면 마음이 아우성쳤다. 아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뭐랄까, 원래는 허락되지 않는 생성과 소멸이 흡사 ‘문학적 허용’처럼 내게만, 예외적으로, 매일, 허락되는 기분이었다.
크로스핏. 전신을 활용해 최단 시간에 최고 출력을 뽑아내는 고강도 운동(Metcon·메트컨)을 근력 운동(Strength·스트렝스)과 결합한 것. 그걸 알고 크로스핏을 시작하는 사람을 적어도 나는 보지 못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운동하는 이유가 그렇듯 살 빼려고 시작한다.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 운동 시간이 짧다던데 하는 정보에 혹해서. 그러곤 충격과 공포, 좌절과 패배감에 빠진다. ‘내 몸뚱이가 이렇게 비루한 것이었던 것인가.’ 여기가 크로스핏 덕질의 첫 갈림길이다.

이런 거다. 내가 첫날 했던 ‘크로스핏 와드’(Workout of the Day, 크로스핏의 하루 운동)는 줄을 타는 것(Rope climb, 로프 클라임). 맞다. 천장에 매달린 굵은 동아줄을 잡고 오르는 것이다. 가끔 올림픽 앞두고 대표 선수들의 구슬땀 같은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기본 반찬으로 등장하는 그 행위. 그걸 내가 한다니 좀 웃겼다. ‘그걸 왜?’ 당연히 못했다. 대롱대롱 줄에 매달려 진자의 추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코치가 외쳤다. “내려오세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는데, 얼굴보다 발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창피와 모욕의 죽을 맛이 이어지던 며칠 뒤 또 다른 워드를 하는데 코치가 소리쳤다.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간단해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며 살아왔어요. 이거 하나 더 포기한다고 티도 안 나요. 내일이면 포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포기 안 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무수하게 반복된 포기 인생의 마지노선이 여기인 것만 같아서. 그리고 그건 묘한 극복이었다. 해야 할 필요가 없던 것들과 쟁투하다 쓰러진 나를 느낄 때 알싸했다. 배가 좀 들어가고, 흉근이 더 커져서 내 몸이 남들 보기 그럴싸한 ‘디자인’이 되는 만족과는 다른 차원의 쾌감이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초건강 상태’로 몰아붙여 왔다. 생에 희박했던 만끽이 찾아오자 살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운동장’을 차리는 건 돈이 제법 들었지만.(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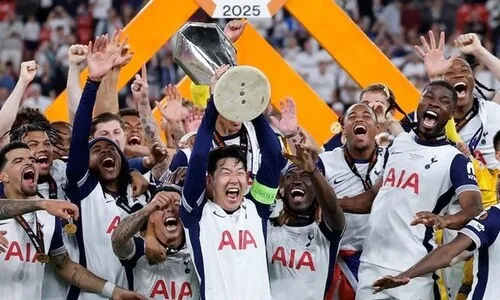












![[단독]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1/53_17540356300102_2917540356139452.png)

![[사설] 윤석열·김건희, ‘법 앞에 예외 없다’ 깨닫게 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3/53_17542159949841_20250803501983.webp)







![[현장에서] 노조 파괴 ‘공범’ 경총의 노란봉투법 걱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1/53_17540413400559_20250801502361.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열람권한 ‘대통령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82/349/imgdb/child/2025/0801/53_17540356300102_291754035613945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