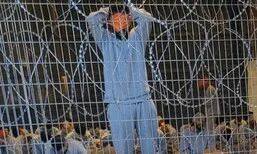강혜승 | 미술사학자·상명대 초빙교수
미술은 대개 사실을 다룬다. 광의의 사실주의인 셈이다. ‘주의’라고 할 때는 관점의 작동을 말한다. 사실을 관점에 따라 표현한다는 의미로, 그런 미술을 사조로 구분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사조는 인상주의라는 기사를 본 적 있다. 공식 통계로 입증됐다기보다 관련 전시의 꾸준한 흥행에 따른 정황적 추측일 텐데, 그만큼 대중에게 친숙하다는 얘기다. 물론 당대의 시선은 달랐다.
1874년 4월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 예술가들의 유한회사’라는 그룹의 전시회가 프랑스 파리의 카퓌신 대로에서 열렸다. 30명이나 되는 이들이 어떤 공통의 가치로 뭉친 건 아니었다. 왕립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전람회 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낙선 작가들의 연대였다. “유치한 벽지보다 못하다”는 혹평 속에서 물감 얼룩을 ‘인상’이라 칭하자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당시 사람들이 회화에 기대한 바는 탄탄한 드로잉 기반의 사실적 모사였다. 조각 같은 형태감 안에 고대 영웅의 서사나 여신의 아름다움이 담기길 원했다. 인상주의자들의 취향은 달랐다. 정교한 선묘 대신 찰나의 붓질로 눈앞의 현실을 그렸다. 여신의 자리를 현대의 매춘부가 채웠으니 당대의 눈에 이보다 더 과격할 수 없던 화면이었다. 건초더미도 작품 주제가 될 수 있는 소재의 민주화가 인상주의자들의 눈에서 시작됐다.
인상주의자들은 각자가 보는 세상을 그렸다. 부르주아 남성의 시선에서 포착된 도시 풍경과 여가 생활, 그중에서도 노동계급 여성과의 성적 거래가 그들의 화면 안에 많은 이유다. 메리 카사트(1844~1926)는 미국 출신인 데다 여성 화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카사트는 부르주아 여성의 눈으로 일상을 그렸다. 당대의 규범에서 여성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과 작업 범위가 한정됐기에 가족과 지인들이 화폭에 담겼다.
카사트의 작품세계는 주로 모성 이미지로 다뤄졌다. 어머니와 아이를 그린 작품이 많은 까닭이다. 첫 연구서는 ‘아이와 어머니를 그린 화가’라는 제목으로 1913년에 나왔다. 미술사학자 그리젤다 폴록은 여성과 아이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모성’과 ‘아이와 어머니’로 보는 시선의 차이를 말한다. 100년도 훨씬 전에 아이와 어머니라는 각기 다른 인격체를 그린 화가로 주목된 카사트를 후대의 시선이 되려 모성 이미지로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여기 아이를 씻기는 여성을 그린 작품이 있다. 여성과 아이의 친밀한 순간이 포착돼 있다. 제목 ‘아이의 목욕’이다. 작가는 이들을 어머니와 아이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습적 시선에서 모성애를 다룬 작품으로 언급된다. 사실 기독교 전통 도상인 모자상과도 차이가 크다. 여자아이를 씻기는 여성은 노동자 계급인 보모일 가능성이 크다.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자녀를 두지 않은 미혼의 부르주아 여성이었던 카사트가 쉽게 취할 수 있던 제재였다.
카사트의 작품세계를 40년 넘게 연구한 폴록은 일련의 작품에서 각각의 인물에 주목할 때 보이는 당대의 일상을 전한다. 아기에서 아이가 되어가는 존재의 성장과 그런 성장을 돕는 여성의 노동이 보이고 돌봄과 육아의 가치도 보인다. 어머니와 보모라는 서로 다른 계급 간 관계도 읽어낼 수 있다. 사적인 이야기를 더하면 나의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인 폴록 교수님의 강의를 최근 원격으로 들었다. 카사트의 작품을 으레 모성애로 한정했던 시선의 편향을 반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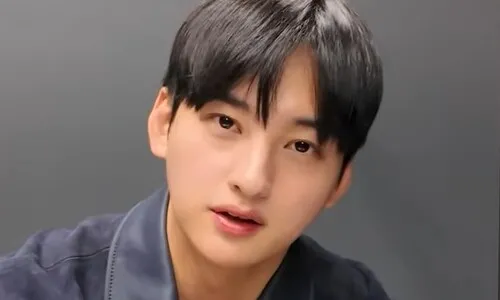











![꼭꼭 숨었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 오기까지 [뉴스A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16/53_17632924020277_20251116502083.webp)


![[단독] 6개월 전 구조진단 했다는데 왜…울산화력 붕괴사고 의문투성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1116/53_17632745840199_2025111650152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