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대북한 정책에서 큰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마시라. 미국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것이 북한을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다급하고, 이라크에서 내전 사태를 방지하면서 발을 빼는 것에 외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 북한 문제가 최고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정권 전복을 꿈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강경파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최근 ‘작전계획 5029’를 가동하려는 시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매파들은 북한 붕괴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자신은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을 진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 그는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찬성했다. 그러나 2005년엔 인권변호사로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반대 서한에 서명했다. 이는 그가 복잡한 한반도 문제에 초보단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바마의 측근 중 누가 그에게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 다행히도,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가 외교정책을 짜는데 적극적 구실을 할 것이다. 바이든의 동아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인 프랭크 자누지는 몇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현안들을 잘 안다. 이들도 국무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척 헤이글 상원의원, 리처드 홀브룩, 앤서니 레이크 등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대다수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로 꼽을 것 같지 않다.
예외가 있다면, 민주당의 전 대선후보 존 케리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이다. 리처드슨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바마 당선자가 자신에게 국무장관을 맡기기로 약속했다고 말해왔다. 리처드슨과 그의 한국계 보좌관인 토니 남궁은 오랜동안 북미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근 만난 북한 외교관들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장기 식량원조에 대한 확약이다. 북한은 미국의 피엘(PL)480법, 즉 잉여농산물 공여 프로그램에 따라 저리의 장기 식량원조를 원한다. 북한 외교관들은 북미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해선,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중지시켰던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합동 수색작업을 재개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며,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에게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진지한 태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는 북한의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가입과 두 기구의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 원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다.
미국 관료집단과 여론 내에서 북한에 대한 견해가 분열돼 있어 위에 언급한 대북 조처의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 북한과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처럼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협상가가 필요할 것이다. 자누지 외에 오바마 진영에서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리처드 댄지그 전 해군성 장관과 브루킹스연구소의 제프리 베이더 중국센터소장 정도다.
물론,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엄청난 진전을 이룰 것이며,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국무장관이 된다면 결정적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매케인이 당선됐다면 나타났을 북한과의 긴장관계와 대조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느리지만 안정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font color="#FF4000">[단독]</font> 수심 43m 바닷속…‘조선인 136명 수몰’ 일본 해저탄광 문 열린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0/53_17548085429051_2025081050146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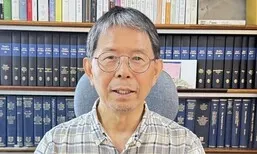
![[단독] ‘윤석열 선물세트’ 뿌렸다…구속 직전 우파단체에 핸드크림·시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227132932_20250810501965.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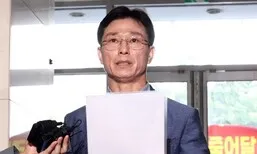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브로커였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10/53_17548052540164_6417544438189611.webp)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슬기로운 기자생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08/53_17546050080529_2025080850008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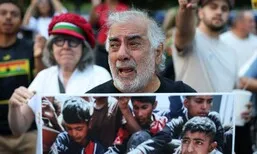




![<font color="#FF4000">[단독]</font> ‘윤석열 선물세트’ 뿌렸다…구속 직전 우파단체에 핸드크림·시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10/53_17548227132932_2025081050196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