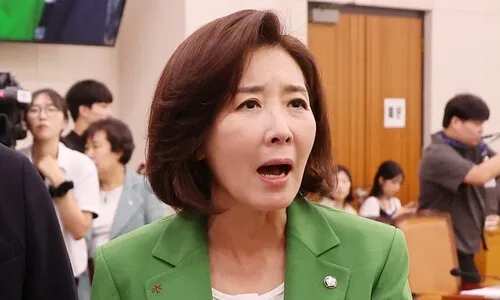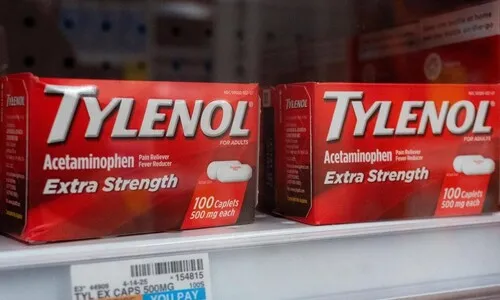지난 20년 동안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높아져 100%를 웃돌고 있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집값이 비싼 지역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추락했다. 지역 맞춤형 세입자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
28일 통계청 이슈분석 보고서(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올라 2015년 기준 102.3%까지 올랐지만 자기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5%에서 2015년 56.8%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가점유율은 20년 새 각각 14.2%포인트와 8.9%포인트 낮아진 34.4%와 40.5%였다. 이어 마포구(-3%포인트)와 관악구(-2.7%포인트), 송파구(-2.5%포인트) 등의 차례로 감소폭이 컸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주택이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해 지난 20년간 주택의 점유 형태와 주거실태 등을 장기 시계열로 분석했다. 전세가구는 19995년에 전체 가구의 29.7%로 월세가구(14.5%)보다 두배가량 많았으나, 2015년에는 전세가구 비중이 15.5%로 낮았고 월세가구 비중이 23.7%로 높아졌다. 과거보다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온 것이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1995년 15%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으나 2015년에는 26.2%로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더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기본적 진단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현재 통계는 주택 공급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맞춤형 세입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임차가구 비중(57.9%)이 자가가구 비중보다 높다. 자가점유율이 2005년 44.6%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15년 42.1%까지 떨어졌다.

최 소장은 “미국의 경우 주택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세입자의 협상력이 너무 약해진 상황이라 보고, 지방정부가 주택 임대료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은 매년 임대료산정위원회가 임대료 상한을 정한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자발적 등록을 우선 추진한 뒤 2020년 이후에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20~34살)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995년 58.2%에서 2000년 31.2%로 크게 떨어졌지만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2015년 37.2%까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이 1995년 4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기준 12%까지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주거빈곤율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주거빈곤율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떨어졌지만,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그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빈곤 청년층보다는 신혼부부 같은 차상위계층에 더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탓에 정책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되지만 주변 시세 자체가 높게 형성된 서울에서는 이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현재 공공임대 예산의 비중이 건설에만 치중돼 있고, 운영은 임대료 수익 등에 맡겨져 있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공공주택 예산의 70%가 입주자 지원 등 운영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Q&A]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13/53_17577182846009_20250913500157.webp)


![[Q&A]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3/53_17577182846009_20250913500157.webp)



![[단독]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23일 심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2/53_17576631522544_20250912502454.webp)




![[단독] 윤석열-이시원·이종섭 통화, 박정훈 영장 기각 직후 새벽부터였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0912/2025091250198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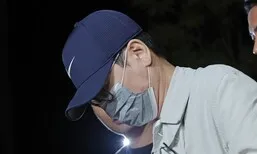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