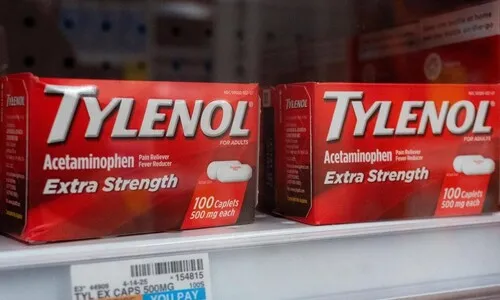역대 정부는 항상 ‘균형재정’을 천명했고, 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재정적자가 무섭기 때문이다. 먼저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의 세부담으로 이어져 성장엔진을 멈춰버릴지도 모른다.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젊은 세대는 미래의 고령인구를 부양하기도 벅찬데, 과거 세대의 정부부채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자 누적↔정부부채 증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서는 재정위기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균형재정을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균형재정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따져보면, 26년 중 22년 적자를 기록했고, 흑자인 해는 4년에 불과했다. 불황기든 호황기든 재정적자가 만성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적자가 반복되면서 정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7~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6.3% 증가(506.3조원→1272.5조원)하는 동안 정부부채는 무려 14.2% 증가(60.3조→443.1조원)했고,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1.9%에서 34.8%로 급등했다. 이자부담도 연평균 9.6% 증가해 ‘재정적자 누적→정부부채 증가→이자부담 증가→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버렸다. 정부부채 규모가 아직은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 속도라면,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1인당 정부부채가 1997년 131만원에서 2012년 886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022만원에 달하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재정적자가 반복되는 것일까? 균형재정 의무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이 가장 큰 요인이다.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2005년부터 9차례 발표됐는데,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계획한 경우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유일하다. 현 정부가 처음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5년 내내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균형재정을 포기한 듯하다.
게다가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부풀리는 관행도 적자 폭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08~2012년 계획을 예로 들면,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경제성장률을 6.8%로 끌어올려 균형재정(+0.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17.4조원의 재정적자를 낳았다. 2013~2017년 계획도 2013년 3.9%, 2014~2017년 4.0%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있어, 실제 재정적자 폭은 더 커질 듯하다. 이밖에도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의 비대화,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 법령에 규정된 의무지출의 급증 등이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명목 국내총생산이 1%포인트 하락할 때, 국세수입은 약 1.072%포인트 감소(약 2.3조원)하고 재정수입은 약 1.255%포인트 감소(약 4.4조원)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결과, 잠재성장률이 1970년대 9.2%에서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3.8%까지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작년에 이어 2%대에 머물러 재정수입이 정체되어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부채는 2012년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더 이상 재정적자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균형재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페이고(Paygo) 원칙’을 당장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정부는 이미 페이고 원칙, 즉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대책을 마련하는 걸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로 정부가 균형재정 의지가 있다면, 법제화에 앞서 스스로 실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조처로 연간 2.4조원의 의무지출이 증가할 전망인데, 보유세 인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페이고 원칙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 확대의 균형,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허용치를 규정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병행되어야 균형재정의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A]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3/53_17577182846009_20250913500157.webp)


![[단독]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청구 인용…23일 심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2/53_17576631522544_20250912502454.webp)




![[단독] 윤석열-이시원·이종섭 통화, 박정훈 영장 기각 직후 새벽부터였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original/2025/0912/20250912501980.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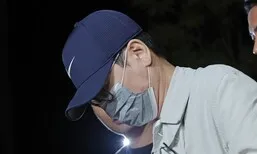



![가자지구는 전지구적 생태학살의 리허설이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11/53_17575493209548_20250911500233.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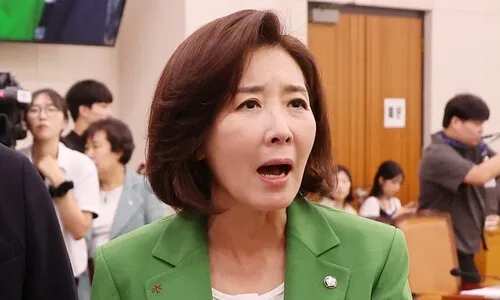
![<font color="#00b8b1">[Q&A]</font> “2차 소비쿠폰,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는 못 받아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13/53_17577182846009_20250913500157.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