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본격화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된 대출액이 은행별로 최대 60배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소득상승 등 채무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이를 은행에 알려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다. 2002년 도입됐지만 서류 속에 잠자고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타고 본격화됐다.
8일 <한겨레>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씨티은행 등의 지점 6곳을 방문한 결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별도 안내문을 비치한 곳은 하나·씨티 2곳에 불과했다. 하나는 대출 창구에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팸플릿과 에이(A)4 크기의 안내문을 비치해 놨고, 씨티는 에이4 크기의 안내판을 세워 놨다. 하나은행 직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안내문을 대출 창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우리·신한·외환 지점 4곳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별도 홍보물·안내문이 없었다. 한 은행 직원은 “지난달 말까지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서 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팸플릿은 없지만 상담할 때 여신약관 등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은행들에 일선 창구 단위의 홍보 강화를 요구해왔다.
은행들의 누리집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께 누리집 공지사항 항목에 금리인하요구권 알림글을 한두 차례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우리 등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항목을 따로 두긴 했지만, 일부러 찾으려 하기 전에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직장인 장경태(35)씨는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은행에서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선 창구의 분위기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대출 실적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점에 별도 홍보물을 비치한 씨티·하나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우리 등은 낮았다. 금감원이 김기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17개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국민·우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은 각각 31억원(88건)과 15억원(59건)에 불과했다. 반면 두 은행보다 가계대출 규모가 적은 하나·씨티의 운영 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636억원(662건), 976억원(1248건)에 달했다. 그 차이가 60배에 가깝다. 17개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1019억원 1818건)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우리은행과 부산은행(15억원 42건)이었다.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우리·신한은 1200억~1700억원(160~230건) 수준에 그쳤지만, 하나은행은 1조2823억원(457건)에 달했다. 수용 실적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1조4065억 2515건)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금감원의 한 간부는 “은행 간에 대출 금리 인하를 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일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매우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씨티은행은 ‘대출 이탈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업대출 유지에 위해 금리인하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업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에 좀 더 민감하다. 대출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수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료 작성에 있어 은행간 기준이 조금씩 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적 문제라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런 부분을 일부 수용해 지난달 말 각 은행에 ‘자료 작성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진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font color="#FF4000">[단독]</font> 통일교 2인자, 권성동 통해 윤석열 독대…수첩엔 “대박, 역사적인 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723/53_17532407262079_251753239796473.webp)
![이 대통령 지지율 57%…‘8·15 사면’ 부정평가 54%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448222099_20250821500919.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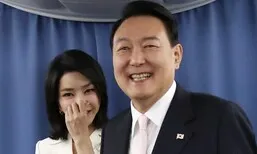
![[사설] 내란 특검, ‘대국민 사기극’ 벌인 한덕수 철저 수사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0/53_17556824730134_20250820503637.webp)




![[속보] 채 상병 특검,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수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426258027_20250821501464.webp)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압수수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376564088_20250821500821.webp)




![[단독] 트럼프에 209조 기업 투자 보따리 푼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0/53_17556860329806_20250820503752.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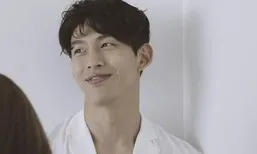

![한정애 민주 정책위의장 “당정대, 이견 없이 검찰개혁 추진할 것” [영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370224383_20250821500730.webp)
![당정대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 [영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0/53_17556966286765_20250820503964.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채 상병 특검,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수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1/53_17557426258027_20250821501464.webp)
![이 대통령 지지율 57%…‘8·15 사면’ 부정평가 54%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1/53_17557448222099_20250821500919.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821/53_17557400962282_6217557396817596.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