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야 철 모르고 낳았지만, 둘째는 제정신으론 못 낳죠.”
웹디자이너 김민경(가명. 28) 씨는 둘째 계획을 묻자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올해 ‘1년차 초보맘’인 김 씨는 출산휴가가 끝나기 직전, 친정언니집 근처로 이사했다. 회사까지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이의 육아 때문이다. “육아도우미를 쓸 형편은 안 되고, 아이를 봐주겠다고 선뜻 나서준 사람이 언니밖에 없었거든요.” 언니마저 없었다면 출산 자체를 접었을 거라며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를 돈으로만 기르나”김 씨의 둘째아이 계획을 원천차단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 부담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적당한 탁아 방법이 없고 도우미 등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출산장려대책들은 “하나 같이 와 닿지 않는다”고 김 씨는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2억2천만원이 필요하다는데, 출산비용 지원금, 도우미 지원 등의 단타성 정책을 믿고 둘째를 낳길 바라는 건 무리죠.”
연년생인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황미경(38) 씨는 “이제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나오는 정책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황 씨는 “아이를 돈으로만 기르냐”고 반문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책이 대부분인데,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게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일하는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거든요.”
현실 앞에 제도는 힘이 없다. “무조건적인 시간 확보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시점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나’가 관건”이라는 게 황 씨의 주장이다. 장기간 휴가가 보장되어도 그 뒤에 자리가 보장될지,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등 휴직 그 이후에 대한 걱정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정상희(28) 씨는 “육아휴직 이후의 동료들을 보면 아이 낳기가 겁난다”고 말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1년을 꼬박 챙기기는 보통의 직장에서는 힘들다. “육아휴직 1년을 꼬박 챙긴 동료들은 두 종류로 갈려요. 거의 회사로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부서로 발령받기 일쑤지요.”
이처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나타난 배경은 절대 간단치 않다. ‘위미노믹스(womenomics)의 시대’라는 말처럼 여성의 경제 참여는 이제 대세다. 하지만 조직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 문화도 아직은 먼 얘기다. 갈수록 증가하는 자녀양육의 부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얽혀 있다. 한두 해 동안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저출산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9월 12개 부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다. 지난 1월 자연분만비용에서 개인부담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보육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이 위원회에서 나왔다.
상반기 안에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범정부적인 조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인구문제연구소 박은태 소장은 “지금의 인구정책 입안자 가운데 인구학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 정책이 상식적인 선에 머무르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위원회 내 저출산대책팀 정선용 팀장은 “인구학적 연구가 부족해 산아제한정책을 그만두어야할 시점을 놓쳐, 정책의 전환이 늦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더 호들갑스럽게 느껴지는 저출산 정책이 여성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산아제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 팀장은 “정부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 가임기의 남녀의식을 조사하면 희망자녀 수는 두 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이 1.16에 그친다는 현실은 그 사이에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큰 방향은 출산을 방해하는 장애를 없애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이 장애가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불임가정에는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정책 하나만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곧 발표될 종합대책과 함께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지금은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인 정책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현실적인 결과물을 가져올지는 6월쯤이면 가늠할 수 있다.
조수영 기자 zsyoung@economy21.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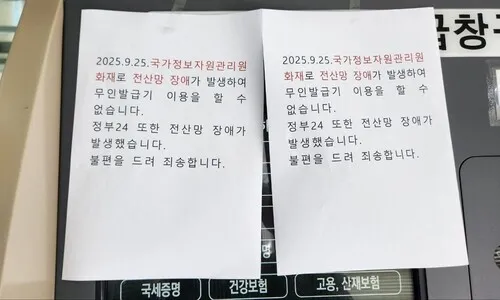











![[단독] 박진 전 장관 “이종섭 임명, 윤 대통령 뜻이라 거부 못 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5/53_17587942517055_20250925503898.webp)


![[단독] 양평군, 김건희 오빠 ‘휴경 농지’ 알고도 2년째 방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6/53_17588648758918_20250926502227.webp)










![[단독] 식약처 “임신중지약 심사 꽤 진행”…합법적 구입할 날 오려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1/53_17584402840592_20250921501699.webp)


![[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926/53_17588916889001_20250926503132.webp)







![가을밤, 하늘에 피어오른 수천송이 꽃 <font color="#00b8b1">[포토] </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927/53_17589768998591_2025092750086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