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희(삼성 스카우트), 구대성(한화), 김광현(SK), 그리고 이번엔 봉중근(LG). 1980년대부터 국제대회를 통해 일본 킬러로 자리매김한 이들이다. 공통점은 모두 왼손투수라는 것. 왜 일본 킬러는 모두 사우스포(좌완투수)일까?
일부에선, 일본에 왼손타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번 세계야구클래식(WBC)에 참가한 일본 타자 15명 가운데 9명이 그렇다. 18일(한국시각) 열린 한-일전에서 선발출장한 9명 중 5명이 왼쪽타석에 섰다. 하지만 예전에는 왼손타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왼손타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긴 힘들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던 김성근 에스케이 감독은 최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일본리그에는 뛰어난 왼손투수가 없다.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는 있지만, 스피드까지 갖춘 왼손투수는 드물다. 평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투수일지라도 계속 당하는 것이다.” 여러 일본 구단이 지난 시즌 말 두산 좌투수였던 이혜천(야쿠르트) 영입에 관심을 보인 것도, 그의 강속구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감독은 “일본야구 역사를 통틀어도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왼손투수는 한 둘뿐이다. 내가 선수로 뛰던 1960년대에도 국제대회에서 나나 다른 왼손투수가 나가면 일본 선수들이 꼼짝못했다”고 했다. 김광현의 경우는, 일본이 몇 달 동안 철저히 연구했고 볼스피드나 변화구 제구가 베이징올림픽 때 같지 않아 얻어맞은 것이라고도 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만난 한 일본 기자는 투구폼을 언급하기도 했다. 봉중근이 체인지업을 뿌릴 때 공을 놓는 위치를 보기 힘들어 일본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구대성도 투구할 때 팔을 감추고 던지는 특이한 투구폼으로 유명하다.
정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몇 년새 한국이 좌투수 전성시대를 맞았다는 점이다. 일본이 넘어야할 벽이 봉중근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샌디에이고/김양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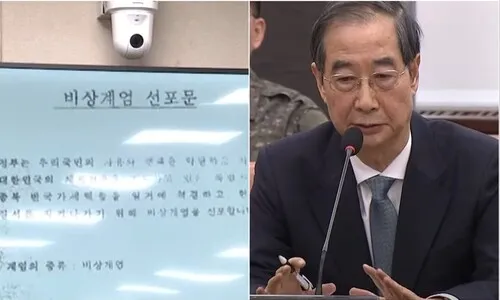



![[단독] 이혁 주일대사 내정자, 한-일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2/53_17558566681146_20250822502858.webp)







![[단독]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686752508_20250821504054.webp)





![[포토] 황폐한 가자지구…이 지옥은 언제 끝날까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2/53_17558448310326_2025082250227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