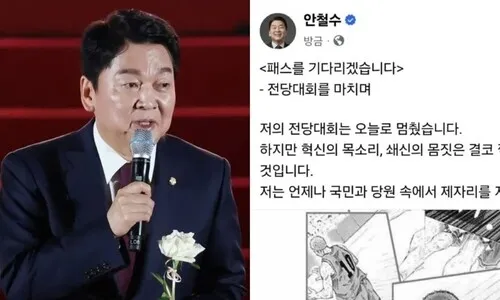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8일 노동신문에 실린 ‘서면입장문’에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도 참전 지역을 ‘쿠르스크’로, 참전 성격은 ‘해방작전’으로 한정한 것이다.
지난해 10월18일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뒤, 미국 등 관련국 정부도 참전 북한군의 작전 지역이 대체로 쿠르스크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런데 왜 쿠르스크였을까? 이는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쿠르스크 전장’이 차지하는 독특한 성격과 연결돼 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수미주와 접한 러시아의 서부 국경도시다. 우크라이나군이 불리한 전황의 돌파구를 열고자 지난해 8월6일 쿠르스크를 전격적으로 공격해 일부를 점령했는데,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한 첫 사례다.
이런 사정에 비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북한군의 참전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한정된 건,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아닌 ‘방어전쟁’에만 함께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려는 전략적 판단의 소산으로 풀이된다. 유엔(UN) 헌장은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19일 새로 체결된 현행 북-러 조약도 4조에서 “쌍방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로 군사적 지원을 한정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참전 지역을 쿠르스크로 한정해야만 유엔 헌장을 위반하지 않고 북-러 조약을 이행했다는 주장을 할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가 “우크라이나 당국이 최정예 무력으로 로씨야(러시아) 본토를 맹공하여 꾸르스크주의 1200여㎢에 달하는 지역을 강점하고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직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이 푸틴의 참전 요청에 응하면서도 ‘침략전쟁에 용병으로 나섰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고 이번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고 러시아 땅이던 쿠르스크로 참전 지역을 한정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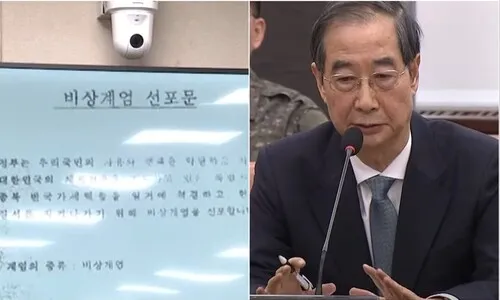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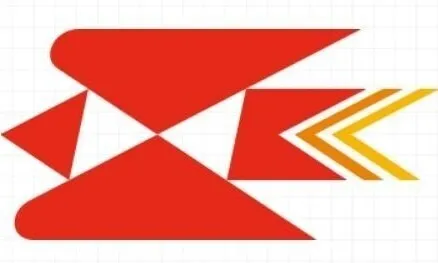

![[단독] 이혁 주일대사 내정자, 한-일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2/53_17558566681146_20250822502858.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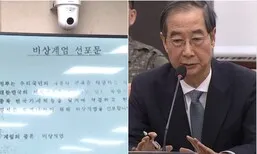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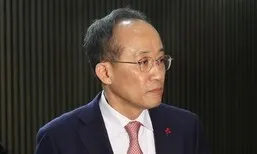




![[단독]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1/53_17557686752508_20250821504054.webp)





![[포토] 황폐한 가자지구…이 지옥은 언제 끝날까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822/53_17558448310326_20250822502277.webp)